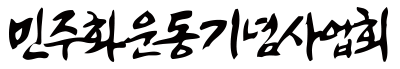열정으로 노동자와 하나된 노동문화예술단 일터
| 붉은 조명이 들어오고 막이 올라가면 그들은 노동자가 된다. 노동자의 슬픔, 한, 애틋함을 담아 춤추고 노래하는 노동자가 된다. 한편으로 그들은 사장님, 자본가가 되어 있기도 한다. 노동자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그래서 관객에게 웃음과 잠깐의 위안이 되어주는 역할 또한 기꺼이 되어준다. 무대 위는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로 가득하다. 금방이라도 무대에서 뛰어나와 함께 싸우러 나갈 것 같은 힘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노동문화예술단 일터’가 뿜어내는 열정으로 그들은 노동자와 하나가 된다. |
| 부산 범어사역에 위치한 지하 연습실. 직접 대패질을 해서 마루바닥을 깔고 계란 판으로 방음장치를 한 투박한 모습이지만 훈훈한 사람냄새와 그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곧 다가올 공연 연습이 한창이었던 단원들의 목소리가 여간 힘차지 않다. 노동 극이라는 특성 때문일까. 잔잔하고 세밀한 표현에 앞서 먼저 소리로 제압한다. 노래와 춤, 극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메시지가 강한 연극. 그것이 ‘노동문화예술단 일터’의 특징이자 매력이다. 십수 년간 ‘일터’와 동락해온 윤순심 대표는 “예전에 비해 노동 집행문화가 대규모로 바뀌었죠. 천 단위, 만 단위 관객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는 촌발 날리지만(?) 크고, 강한 것 그리고 현장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고 말한다. ‘일터’가 ‘촌발 날리는’ 순수 창작 노동 극만을 고집해 온지 벌써 17년이다. |
 |
|
노동자문화운동이라는 개념조차 설익었던 80년대 중반, 대학에서 문화패 공연을 하던 학생들이 야학에서 노동자들에게 풍물이나 연극, 탈춤 등을 가르치면서 ‘일터’가 싹트게 되었다고 한다. 87년, 이석규 열사가 수류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일터의 초기 선배들이 풍물을 메고 장례식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은 적도 있고 공연을 위해 준비했던 여러 소도구들이 검문에 걸려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를 건너 왔다.
맨 몸으로 부딪히다 |
 |
이런 와중에서도 어렵게 받은 공연비를 파업기금으로 몽땅 기부하고 겨우 차비만 남겨서 달랑달랑 돌아올 때가 많았다며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인데, 그때 선배들이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라며 윤 대표는 웃음 짓는다. 공연비로 조금씩 받는 돈은 ‘일터’ 유지비며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한 스튜디오에 투자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급받는 활동비는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친다. 그나마도 건너뛰는 일이 비일비재. “여기서는 농담처럼 돈버는 아내나 남편을 얻지 못 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활 유지를 못 하니까요. 그러니 내부에서 커플이 생기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불러다가 ‘헤어지지~~’하고 압력을 넣어도 사람 감정이 어디 그럽니까. 그러다가 결혼하면 사무실에서 쌀도 좀 퍼가고, 김치도 얻어가고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안쓰럽죠. 아이가 생겨나면 더 감당하기 힘들죠. 그럼 또 직장을 찾아 떠나가고…… 떠나보내야지 어쩝니까.” |
|
결국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후원회를 좀 꾸려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후원회 가입을 부탁하는 일이 그리도 어려울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단돈 몇 천원을 부탁하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고 등에서 식은땀이 다 흘렀다고. “차라리 우리가 도움을 요청받는다면 쌀이라도 좀 보태주고 얼마든지 밤새서 일 할 수 있겠는데 말이죠.”
노동이라는 화두의 의미
청소부 이야기도 연극이 되나요? |
| 사실 그렇다. 영화를 보고 연속극을 봐도 노동자가 주인공인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직업이 노동자로 설정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노동의 실제 모습이 다루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드문 일인지. 2년 전, <야간 인생>이라는 청소부의 삶을 연극으로 꾸미면서 청소부들을 인터뷰 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청소부 이야기도 연극이 되나요?”였다고 한다. 이 물음에 ‘일터’는 연극으로써 시원한 답을 던져 주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무대에서 펼쳐지면 눈물도 많이 흘리십니다. 공감이 되니까요. 또 사람들은 주로 자신들의 문제가 전부인 줄 알잖아요. |  |
그 애환을 보면서 일반 관객이나 다른 노동자들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술의 주인공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연극이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들의 공연이 많은 노동자들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이유, 그것은 허구가 아닌 노동자들의 진실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노동’과 ‘일터’를 고집하는 이유를 물어보기도 새삼스럽다. “그러게…… 이상하네……”하며 머리를 갸웃거리는 윤 대표와 “그래도 집에서 노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좋은 일 하면서 바쁘지 않나”하면서 허허 웃어버리는 박 감독. 결국에는 “하는 일을 더 잘할 생각을 해야겠죠.”라며 앞을 향해 시선을 내뻗는다.
이제 그들은 그동안 담아온 노동자의 소리를 일반 시민들에게 들려주려 한다. 노동의 현실과 가치, 전망을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만 맴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아우를 수 있어야 노동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로를 이어주는 건강한 매개체로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일터’는 거친 숨을 내쉰다. 이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놓을 차례이다.
|
글 / 서민숙 사진 / 황석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