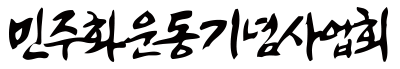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시대와 시] 시대를 향한 깊고 퀭한 눈, 김수영
![[시대와 시] 시대를 향한 깊고 퀭한 눈, 김수영 사진](https://www.kdemo.or.kr/nuri/img_src/201101/chapter/images/view05_1.jpg) 글·서효인 humanlover@naver.com 김수영을 읽는다는 것어떤 시인은 시대를 대표하기도 한다. 보들레르는 자본이 잠식하기 시작한 파리의 뒷골목을 상징하고, 파블로 네루다는 칠레 혁명과 그 속의 민중, 그 자체이다. 우리에게도 한 시대를 혁명처럼 살아간 시인이 있었다. 그는 시를 쓰고 책을 읽었으며, 번역을 하고 술을 마셨다. 포로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왔으며, 양계업으로 생계를 꾸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온몸으로 시를 썼다. 그에게 창작이란 자유와 다른 말이 아니었다. 김수영의 시는 당대의 상처를 찢고 핥았다. 그리고 시대의 쓰라림을 제 속에 취하도록 들이부었다. 한국현대사에서 시대와 시라는 키워드는 다음의 언명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1960년 4월 19일 그리고 김수영. 김수영을 읽는 것은 폭포와 같았던 우리의 시대를 읽는 것이다. 서러움의 밑바닥에서 그가 스스로 말하길 아무리 책을 읽고 공부를 하여도 완전한 인간은커녕 불완전한 인간도 되기 힘들다 하였으니, 그가 되지 못한 것은 인간 자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김수영은 시인이자, 산문가, 철학자, 혹은 시대의 지식인이었다. 그는 번역일을 업으로 삼을 정도로 영어에 능했으며 영어로 된 외서를 즐겨 읽었다. 하이데거에 심취하고 서양의 최근의 이론과 사상을 습득하였다. 그렇기에 김수영의 초기 시는 고도의 모던한 감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의 모던함은 시대의 풍파에 다시금 태어난다. 인민군에게 끌려가 의용군이 되었던 김수영은 목숨을 건 탈출극을 벌인다. 하지만 그가 남한으로 올 수 있게 되었을 때 김수영의 신분은 전쟁포로였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김수영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을 느낀다. 존재 자체를 박탈당하면서도 기어코 살아남은 시인에게 남겨진 상황은 훈련소에서 그것이 가장 아래에 있는 고통은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가 믿었던 친구와 함께였던 것이다. 전쟁의 고통과 개인사의 아픔이 범벅된 젊은 날을 김수영은 견뎠다. 그가 지나온 마리서사茉莉書舍와 명동의 뒷골목, 시를 쓰던 그의 동료들과 술이 김수영의 곁에 있었지만 시인은 결국 혼자였다. 시대의 어두움을 가장 밑으로, 밑으로 통과한 시인에게 처음으로 남은 감정은 서러움이었다. ![[시대와 시] 시대를 향한 깊고 퀭한 눈, 김수영 사진](https://www.kdemo.or.kr/nuri/img_src/201101/chapter/images/view05_2.jpg) 시인의 자유에 적당히는 없다 평생을 서러움과 독대했던 김수영이 그에 대항하여 키어온 정신은 바로 자유였다. 김수영에게 있어 자유는 시를 쓰고 문학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는 그것을 언론의 자유라고 일컫는다. 여기서 언론의 자유는 예술가가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승만 정권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팔 할이고, 4·19 혁명 이후에 보장된 자유가 구 할이라고 해서 혁명 후의 정부가 더 나은 것이 될 수는 없다고 김수영은 단언한다. 시를 쓸 때에 이것을 써도 되는가 이렇게 과격해도 되는가라고 짐작해보는 조심성 자체를 김수영은 멸시하는 것이다. 김수영은 생각이 아닌 온몸으로, 시의 자유를 끝까지 밀어붙이기를 주장하고 실천한다. 김수영의 흔적 중, 뭇사람의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의 사진이다. 움푹 들어간 양볼, 그것보다 더 얼굴 안에 위치한 큰 눈, 그 두 눈에서 뿜는 빛,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흰 티까지. 그는 오른 팔에 머리를 기댄 채 어딘가를 골똘히 쳐다보고 있다. 짙은 눈썹 사이와 코밑에 선명한 주름은 폭포처럼 거침이 없다. 김수영의 이러한 인상은 과연 시인답다. 이제까지 어떤 시인이나 작가의 프로필 사진보다도 시인답고 또 시인답기 때문에 김수영답다. 확고부동한 그의 표정과 포즈는 지식인으로 지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표정이었다. 현실을 바로보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명제에 괴로워했던 김수영. 그는 현실과 문학에 대해 항상 불평과 불만에 가득했으며, 거의 결벽에 가까운 성격으로 그것을 대했다. 그의 불평은 자의식의 발로였으며, 부족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에게는 도무지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자유. 절대적 명제를 획득할 수 있는 혁명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시대와 시] 시대를 향한 깊고 퀭한 눈, 김수영 사진](https://www.kdemo.or.kr/nuri/img_src/201101/chapter/images/view05_3.jpg) 4·19 혁명과 김수영의 노고지리 김수영이 생각한 자유가 한꺼번에 분출한 사건이 바로 4·19혁명이었다. 김수영은 4·19 혁명에서 학생들의 행진과 외침을 하나의 시로 보았다. 거리에 모인 인파의 흐름이 곧 자유정신의 뜨거운 발언이며 그것의 실현으로 생각했다. 김수영은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직설적이고 산문적인 시를 혁명의 기간 동안 여럿 쓴다(「하…… 그림자가 없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육법전서와 혁명」, 「나는 아리조나 카우보이야」등). 이승만의 하야 소식을 들은 김수영은 몹시 감격해 흐느끼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러한 감격을 시를 쓰는 행위로 표출한다. 그는 밤새 술을 먹고, 다음날 열정적으로 시를 썼다. 술 먹은 다음날에 시를 쓰는 것은 김수영의 평소 습관이기도 했지만, 이 시기의 김수영은 예년에 비해 곱절이나 많은 시를 쏟아낸다. 혁명의 기운이 시인에게 강력한 감흥을 준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시들은 김수영이 평소에 열렬히 주장하던 시적 자유에 더욱 충실하다. 전통적인 시적 정조에서 벗어나 김수영 특유의 강인한 어투가 언어의 결에 따라 살아난 것이다. 김수영은 흥분과 환희와 더불어 시대와 시인, 시와 양심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더욱 천착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가 올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좋은 세상을 위한 시, 통일을 위한 시, 통일이 된 이후에도 세상에 필요한 시를 김수영은 꿈꾸었다. ![[시대와 시] 시대를 향한 깊고 퀭한 눈, 김수영 사진](https://www.kdemo.or.kr/nuri/img_src/201101/chapter/images/view05_4.jpg) 어느 날 소시민이 되어 현실을 노려보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의식을 던진 김수영. 그가 필요한 것은 자유였고, 4·19혁명은 그가 꿈꾸던 자유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김수영은 지금의 혁명이 완전무결한 것이 아님을 느끼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처음 맛본 민중의 승리는 단합된 혁명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기에 너무나 뜨거웠다. 김수영은 통일을 꿈꾸며 그것이 자유의 완결이라 생각했지만 현실 정치에서 김수영과 젊은 학생들의 이상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시간을 두고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였다. 그러나 미처 과제를 해결할 겨를도 없이 서울 시내에 다시 군홧발 소리가 들려왔다.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군인들의 반란은 일견 소란스럽게 보였던 서울의 봄을 단번에 정리해버렸다. 그것은 4·19혁명의 아픈 결말이었고, 김수영에게 있어서는 불구가 된 자유였다. 김수영은 자유를 노래하던 격정에 찬 시인에서 소시민의 삶을 되돌아보는 냉소적 시인이 되어 있었다. 5·16 이후 김수영은 동료의 집에 잠시 피신해 있었다.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그들의 공약은 김수영에게 공포를 불러왔다.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일주일 후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양계에 힘쓴다. 혁명이나 쿠데타와 상관없이 그의 생활은 전과 다름없었으나, 그의 정신은 불안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불안은 포기와 한탄이 되었다. ![[시대와 시] 시대를 향한 깊고 퀭한 눈, 김수영 사진](https://www.kdemo.or.kr/nuri/img_src/201101/chapter/images/view05_5.jpg) 풀보다, 바람보다 먼저 김수영으로부터 시작한 참여시의 정신은 그의 짧은 생 뒤로 이어진 다른 시인들의 영혼에 결코 가볍지 않은 결기를 남겼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김수영을 읽는다. 그를 읽는 것은 혁명을 읽는 것이자, 시대를 읽는 것이다. 김수영의 정신은 곧 자유의 정신이며, 그는 1960년대 문학의 진한 피이자 독한 술이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식인의 정신이 되어, 시인의 정신이 되어 지금까지 도도히 흐르고 있다. 1969년 6월에 교통사고로 김수영은 세상을 뜬다. 그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잠식했던 유신과 긴급조치와 계엄령을 그는 보고 있었을까. 그 깊고 퀭한 눈으로 말이다. 그는 아마도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민중과 시민의 힘을 끝내 믿었을 것이다. 다음의 시처럼. ![[시대와 시] 시대를 향한 깊고 퀭한 눈, 김수영 사진](https://www.kdemo.or.kr/nuri/img_src/201101/chapter/images/view05_6.jpg) |
| 글 서효인 시인, 2006년 계간 <시인세계>로 등단, 시집 『소년 파르티잔 행동지침』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