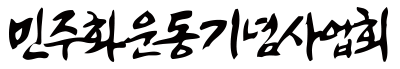전태일의 흔적 따라, 길을 걷다.
전태일의 흔적 따라, 길을 걷다.
글 장남수/ jnsoo711@hanmail.net
밤새 내린 비로 고속도로는 젖어있었다. 전태일! 그가 살았던 흔적을 따라 나선 오월, 비에 젖은 신록은 연둣빛으로 고왔다. 전태일기념재단의 12인승 승합차에 가득 끼어 앉은 전태일의 후예들은, 노동자의 자긍으로 부활한 선배가 나고 자란 땅을 밟는다는 사실에 살짝 흥분되어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박계현 사무총장도 호흡을 조절하며 비오는 고속도로를 달렸을 것이다. 서울을 벗어나면서부터는 다행히 비는 잦아들기 시작했고, 대구에 도착했을 때는 걷기 좋은 날씨였다.

전태일이 태어난 동산동 311번지 일대는 은행나무가 들어 찬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공원입구에는 ‘바르게 살자’ 라는 표지석이 버티고 있었다. ‘바르게’ 사는 것의 의미도 제각기 갈래를 달리하는 시대이지만 전태일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바른 삶’을 열망했던 이가 아니었던가.
전태삼씨는 기억을 더듬어 이곳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곳이라고 했다. “노란 쌈짓돈을 꺼내 주시곤 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빈소 불빛 아래에 제비콩이 예쁘게 반짝였다.”고 말했다. 관리들이 많이 사는 중산층 주거지역인 동산동에서 태어난 것은 포목점을 크게 하셨던 할아버지 덕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가세가 기운 탓인지, 장남이 아니어서인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태일의 어린 날은 가난하기만 했다.
이소선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머무셨던, 당시 남산동 50번지 일대의 옛 골목길을 지나 밀집해 있는 인쇄골목을 거치고 남문시장을 지나니 전태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말했던 청옥고등공민학교가 나왔다. 대구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은 `명덕초등학교`로 불리우고 있는 곳. 수위실에 양해를 구한 후 학교 안으로 들어가니 입구의 아담한 정원에 ‘행동은 바르게, 생각은 새롭게’ 라는 표어석이 반겨주었다. ‘명덕관’이라고 적어진 오른쪽 새 건물이 당시 청옥고등공민학교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귀한 인연을 지닌 어르신을 만나 뵐 수 있었다. 청옥고등공민학교에서 전태일을 가르치셨던 이희규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이 학교는 1940년 남부칠상소학교였던 것이 1953년에 명덕초등학교가 되었고 학교안의 교사 하나를 고등공민학교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앞에는 하수가 흐르는 개천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그 개천을 지나 다녔고 간혹 못된 녀석들도 있어서 태권도를 했던 선생님은 아이들을 지켜주느라 분주하기도 했던 곳이었다. 그때 이희규 선생님은 스물 너 댓 살이었다. 전태일의 일기장에 따르면 그는 원섭, 재철과 삼총사처럼 친했고 재철의 여동생 둘도 이 학교 출신이고 사촌동생 기옥도 같이 다녔다. 이희규 선생님은 역사와 음악을 함께 가르쳤는데 특이한 방송음악 같은 것을 아이들이 좋아했다고 회고하셨다. 수업은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 4교시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학생은 40여 명이었고 분위기가 좋았다. 여학생들 중에는 식모로 일하는 학생이 많았다. 주인집에서 공부하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교사들이 주인집을 찾아가 부탁하기도 했다. 남학생들은 공장, 신문배달 등의 일을 했다.

“전태일군은 사고방식이 똑바르고 불의를 못 참는 학생이었어요. 어렵다고 고개 숙이지도 않았고 자기 할 일은 다 했어요.”
태일은 고등공민학교를 떠나 서울로 간 후에도 선생님께 종종 편지를 보내왔다. 어느 날은 남산에 올라가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었고 총각이었던 선생님에게 빨리 장가가시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당시 내 장가 못간 걸 안타까워했어. 평화시장의 아가씨 한 명을 소개해주겠다고.”
태일과 만나 그런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후 신문을 펼쳤던 선생님은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접했다. 불과 7개월 전에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던 그 친화력 좋고 다정했던 태일이 그렇게 자기 몸을 살라 불꽃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조금의 암시조차 내비치지 않고 그렇게 차곡차곡 마치 일상의 어느 날처럼 자신의 생각을 결행했던 것이었다.
태일의 절친한 친구였던 원섭도 20여 년쯤 전에 이민을 갔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까만 베레모가 회상에 젖어 쓸쓸했다.
다음으로 이동한 장소는 현재 남산동 716번지, 용두동에서 식구들이 모여 살던 때 해군이었던 삼촌(전홍관)이 그 궁핍한 살림을 보다 못해 데리고 내려와 잠시 살았던 큰아버지 댁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돌아 그 집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집의 잠겨있는 대문 앞에서 고개만 기웃거리다 돌아섰다. 집 옆의 자그마한 공터에는 상추가 곱게 자라고 있었다.
대구 동산동과 남산동 일대의 흔적을 이어 현재 카톨릭교육원이 된 옛 효성여자고등학교 옆으로 이동했다. 남산로 8길이라고 적어진 골목길 안쪽의 허름한 벽돌집 앞에서 전태삼 씨가 걸음을 멈추었다. 50년 전 이소선 어머니 태일이 형과 함께 살았던 집이 ‘바로 이 집’이라고 했다.
51년 만에 왔다는 ‘옛집’은, 기와가 얹어진 지붕이 낡아 군데군데 비닐과 벽돌을 얹어 임시 땜질을 해두었고 발로 세게 차면 부서질 것 같은 나무대문이었다.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니 집안에서 개가 짖어댔다. 문틈 사이로 안을 기웃거리다 결국 주인을 불러보았더니 60대 가량의 남자가 나왔다. 전태삼씨가 오래전에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양해를 구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전태삼씨는 집안에 달린 텃밭을 가리키며 여기가 방이 있었고, 여기는 부엌을 같이 썼던 재일이네가 살았고, 재일이 누나가 밥을 해서 갖다 주기도 했었다고 회고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인은 “이 집에 온지 40년이 되었는데 그 텃밭자리에 방이 있었던 게 맞다.”고 했다. 지금은 그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열사의 어린 시절을 아는지 모르는지, 텃밭이 된 열사의 방 자리에는 갖가지 화초들이 무심히 고왔다. 낯선 방문객들이 신경 쓰이는지 강아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자꾸 짖어댔다. 집안을 둘러 본 후 밖으로 나오니 담벼락에는 누가 적어놓았을까, 푸른 매직으로 peace 라고 두 군데나 적어놓은 게 보였다. 그래, 평화! 그러나 이 집에서 어린 날을 보냈던 한 사람은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평화롭지 못하게 산화했다.
남대문시장에서 구두통을 메고 방황하던 열 세 살의 전태일이 부산 영도다리까지 이르러 방파제 아래 떠다니는 양배추 속고갱이를 건지려고 뛰어들었던 자리는 매립되어 있었다. 다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철조망을 넘었던 부산진역은 지금은 폐쇄된 체 철제구조물들만 얼기설기 얽혀있었다. 무임승차로 가없는 길을 떠났던 열네 살 전태일의 불안과 막막함은, 우리가 방문한 울산 현대 비정규노동자의 농성철탑에 걸려 있었다.
맑은 가을 하늘은 구름한 점 없이 깊었으며, 그늘과 그늘로 옮겨 다니면서 자라온 나는
한없는 행복감과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서로간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나는 내가 살아 있는 인간임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진심으로 조물주에게 감사했습니다.
(전태일의 일기 중)
청옥고등공민학교 시절 운동회 날을 기록한 전태일의 일기는 행복과 충만감으로 가득 차 있다. 아버지가 만들어 준 운동 “빤쓰”를 입고 친구들과 마음껏 운동장을 달리며 공부하며 지내는 소박한 일상이 최고의 행복이었던 그는 사람들 모두가 그 ‘행복’을 느끼며 살기를 열망했다.
우리도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의 길을 따라 오늘, 이 길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