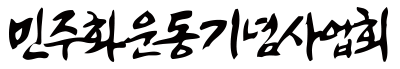독일 통일 26년… ‘체크포인트 찰리’를 찾다
독일 통일 26년… ‘체크포인트 찰리’를 찾다
글. 사진 권기봉(작가, 여행가)/warmwalk@gmail.com
독일이 통일된 지 26년째다. 40여 년의 분단 기간에 비해 26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서로를 ‘베씨(Wessis·서독인)’와 ‘오씨(Ossis·동독인)’로 나눠 부르며 갑작스러운 통일에 따른 불만을 가졌던 이들도 이제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가을 독일 매체 <도이치 벨레(Deutsch Welle)>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통일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서독 출신 응답자의 76%, 동독 출신 응답자의 66%가 ‘그렇다’고 답해 평균 73%에 달하는 이들이 독일 통일을 성공적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눈길을 끈 것은 그들이 분단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였다. 제2차 세계대전과 그 당시 자행했던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다른 사회에 모범이 되지만, 그들은 그러한 과오가 잉태한 ‘분단’과 극복의 결과로서의 ‘통일’의 역사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고 있었다. 이미 끝난 혹은 정리된 상황이니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을 위해 그 정반합의 과정을 시민사회에 올곧이 드러내면서 상호 간의 이해와 화합을 유도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있는 ‘C 검문소’, 포네틱 코드식으로 읽어 ‘체크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라 부르는 옛 검문소 건물이었다.

다만 장벽에는 동-서 간의 교통을 위해 14개 정도의 통로는 뚫어 놓았는데 그 길목마다 검문소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체크포인트 찰리는 그 중 짐머 거리와 프리드리히 거리 사이의 교차로에 위치한 서베를린 쪽의 검문소였다. 이 검문소가 여러 검문소들 가운데 유독 의미가 있는 것은 주변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 때문이다. 그 가운데 단연 첫째로 손꼽히는 것이 '베를린 위기'였다.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고 두 달 남짓 흐른 1961년 10월 22일, 체크포인트 찰리 근처에서 장벽을 철거하려던 미군과 그것을 막으려던 소련군이 탱크를 앞세운 채 꼬박 하루를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서로 탱크를 뒤로 물리며 사태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당시의 살풍경은 오랜 기간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수 없었다.

20세기 세계사와 관련한 순간들의 주요 현장이었던 체크포인트 찰리…. 그러나 사실 이 검문소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용도를 잃고 말았고 급기야 1990년 6월 들어서는 건물과 도로를 정비한다는 구실로 아예 폐쇄되어 철거된 적이 있다. 검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통과하려는 차량을 막기 위해 지그재그로 설치한 콘크리트 장애물과 바리케이드, 그리고 2층 높이의 감시탑 등 서베를린 쪽의 체크포인트 찰리보다 훨씬 삼엄했던 동베를린 쪽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쓰디쓴 시대였지만 이제는 지난 일이라 여겨 과거의 일로 돌리자는 듯, 하나 같이 지우고 없애는 데 방점을 찍는 듯했다.
그러나 베를린 시민 사회, 나아가 독일 사회의 생각이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 그 중에서도 체크포인트 찰리가 갖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당국은 원래의 위치에 체크포인트 찰리를 다시 세우고 베를린 장벽이 지났던 곳에는 자갈 등을 이용해 선을 그려두는 식으로 역사적 기억의 매개체를 다시 불러올 수 밖에 없었다. 체크포인트 찰리는 통일이 되었으나 베씨와 오씨로 양분화되어 가던 독일 사회를, 그러한 과정에서 행여나 싹틀 수 있는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반목 나아가 파시즘에의 관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반촉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한 지난했던 노력과 좌절 그리고 성취를 대표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물론 이미 한 번 사라진 문화재가 예전과 똑같이 복원될 수 없듯 다시 지어진 체크포인트 찰리도 예전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건물의 재료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달라졌다. 예전의 체크포인트 찰리가 단순히 대결의 기억을 간직한 검문소였다면 지금은 친근하게 옛 역사를 들려주는 안내자와도 같은 존재다.

그렇다 보니 시각에 따라서는 이런 체크포인트 찰리를 두고 값싼 관광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론이 없지 않다. 체크포인트 찰리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면 바로 옆에 위치한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Haus am Checkpoint Charlie)은 체크포인트 찰리는 물론 그것을 둘러싼 1940~1980년대의 싸늘했던 냉전기를 위아래로 또 좌우로 조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베를린 장벽 사이로 설치되어 있던 검문소들을 통해 동서-베를린 사이를 오고간 인적이며 물적인 교류의 양과 질,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능했던 동서독간 이질화된 요소들의 보완…. 비록 검문소나 박물관은 말 한 마디 할 수 없는 무생물이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은 융숭하고 깊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유럽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극우주의의 흐름을 단순히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시는 소수에 대한 차별과 배타 그리고 전체주의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분단과 냉전이라는, 체크포인트 찰리가 대표하는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단순히 흘러간 옛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앞날을 밝혀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독일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분단되었으나 통일은 커녕 서로에 대한 무시와 극단적 대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오늘…. 1.21 사태 당시의 총격전을 기억하고 있는 서울 백악산 자락의 일명 ‘김신조 소나무’나 전쟁기념관 야외전시장에 놓여져 있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때의 고속정 참수리 357호 등 한국 사회에는 아직까지 ‘잊지 말자 북괴의 만행’을 부르짓는 식의 기념물만 넘쳐날 뿐 배척 수위를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위험요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에 대한 관심은 적어 보인다. 유라시아 대륙의 저쪽과 이쪽 사이의 간극이 이처럼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