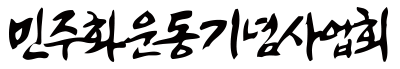무참한 ‘세월’을 다시 부른다
무참한 ‘세월’을 다시 부른다
이상국 ‘슬픔을 찾아서’, 노혜경 ‘칼산 불바다를 통과하는 중인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러고 보니 올해 총선은 세월호 참사 일어난 날에 하네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불쑥 던진 말이었다. ‘응?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설마, 정말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2, 3초 정도 다시 기억을 확인한 뒤에야 나는 대답했다.
“에이,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이에요. 총선은 13일이고.”
우리는 누구랄 것 없이 멋쩍게 웃었다. 우리는 올해 총선일을 헷갈렸던 걸까, 아니면 2년 전 4월 16일을 깜빡 잊어버렸던 걸까.
그때는 속으로, 왜 하필 ‘세월’일까 원망스러워 한 적도 있었다. 앞으로 한동안은 글을 쓰면서 ‘세월’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 단어를 쓸 때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무력감이, 그날의 죄스러움이, 그날의 노여움이 가슴팍에서 다시 돋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무참한 세월이 700일이나 흐르는 사이, 우리는 깜빡 그날의 기억 밖으로 세월을 밀쳐두고 있었나 보다.
3월 15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딱 700일 되는 날이었다. ‘416광장’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행동한 시민들의 사진 등을 전시한 기획전시관이 만들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사람들은 3월 15일부터, 참사 2주기인 4월 16일까지를 ‘추모의 달’로 정하고 전국 100여 곳에서 집중 추모행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콘서트와 걷기대회, 범국민추모대회도 연다. ‘아직도’ 그곳에는 노란 리본을 단 사람들이 모여, ‘여전히’ 잊지 말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3월 28일과 29일에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열린다고도 했다. ‘아직도’ 그들은 진실을 원하며 싸우고 있고, ‘여전히’ 이 나라는 진실을 깔고 앉아 세월만 보내고 있다.
슬픔을 찾아서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며
이런 나라 사람 아닌 것처럼 겨울 팽목항에 갔더니
울음은 모래처럼 목이 쉬어 갈앉고
울기 좋은 자리만 남아서
바다는 시퍼렇고 시퍼렇게 언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애들처럼 울고 있었네
울다 지친 슬픔은 그만 돌아가자고
집에 가 밥 먹자고 제 이름을 부르다가
죽음도 죽음에 대하여 영문을 모르는데
바다가 뭘 알겠느냐며 치맛자락에 코를 풀고
다시는 오지 말자고 어디 울 데가 없어
이 추운 팽목까지 왔겠느냐며
찢어진 만장들은 실밥만 남아 서로 몸을 묶고는
파도에 뼈를 씻고 있네
그래도 남은 슬픔은 나라도 의자도 없이
종일 서서 바다만 바라보네
계간 <창작과비평> 2016년 봄호(통권 171호, 창비)에 실린 이상국 시인의 시 전문이다. “남은 슬픔”이 “종일 서서 바다만 바라”본 것처럼, 나도 한동안 서서 이 시를 바라봤다. ‘세월’이라는 단어를 다시 쓸 때 생각날 것 같았던 그날의 무력감이, 그날의 죄스러움이, 그날의 노여움이 나를 한동안 멈춰 있게 했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며/ 이런 나라 사람 아닌 것처럼” 욕이나 하는 것은 우리의 못난 버릇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이런 나라 사람 아닌 것처럼”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나 몰라도, 그곳에서는 안 된다. “울음은 모래처럼 목이 쉬어 갈앉고” “시퍼렇게 언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애들처럼 울고 있”는 진도 팽목항 그 바다 앞에서는 누구나 “이런 나라” 사람임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나라”에서 그저 열심히 먹고살기만 한 사람 누구나, 가슴속에 가라앉은 무참한 세월을 끌어올려 마주 볼 수밖에 없다.
‘세월’이란 단어를 다시 마음 놓고 말하는 날은 언제일까. ‘아직도’나 ‘여전히’와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세월호 가족들을 말할 수 있는 날은 또 언제일까. 자식의 목숨 값이나 몇 푼 더 받아보려는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는 불온한 세력이라 손가락질 받고, 가끔은 무시무시한 ‘종북’의 붉은 색까지 덧칠당하며 뒤틀릴 대로 뒤틀린 그들의 삶.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진실을 향해 걸어가며, ‘여전히’ 광장을 지키고 서 있다. 우리가 문득 “그 사람들 아직 거기 있어?”라고 떠올리기 전에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자 가장 큰 일은 ‘기억’이다. 하지만 잊지 말자는 말은 지겹다. 기억하겠다 말만 해놓고 우리는 결국 또 잊어버릴 것 아닌가.
맞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라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래도 이제는 알았다.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을 위한 실천을 부단히 이어간다는 뜻이다. 기억은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기억은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다. 2년이라는 무참한 세월을 버티고 견뎌온 세월호 가족들에게, 무기란 결국 ‘기억’뿐. 변명 같은 내 부끄러운 다짐을 늘어놓는 것은 또 그 때문이다.
칼산 불바다를 통과하는 중인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유리 호롱 속에 켜진 황촉불처럼 우리는 환합니다
그 어떤 화살도 우리를 꿰뚫지 못합니다
그들의 과녁은 애초에 틀렸습니다
그들은 상한 새를 향해 활을 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주하는 표범입니다
그들은 시든 꽃을 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상하는 민들렙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울과 싸우면서 그것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끝나면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푸른 지구에서 태어나 밝은 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노혜경 시인의 시집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실천문학사, 2015년)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실린 시의 전문이다. 사실 앞서 인용한 이상국 시인의 시보다 이 시를 먼저 읽었다. 시에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일지, “질주하는 표범”이자 “비상하는 민들레”인 사람들은 누구일지 궁금했다. 그러다 이상국 시인의 시를 읽고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어떤 화살도 우리를 꿰뚫지 못”할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 “내 소중한 사람들”, “푸른 지구에서 태어나 밝은 별 아래 살아가는” 저 광장의 사람들 말이다.
노혜경 시인의 시집에서 이 시보다 더 뒤에, 그야말로 맨 뒤에 나오는 글이 ‘시인의 말’이다. 시집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우울함의 뿌리를 밝힌 글이다. 시집의 분위기가 우울하지만 시집 마지막 부분에는 이 시가 들어간 이유도 ‘시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직도’ 기억을 무기로, ‘여전히’ “칼산 불바다를 통과하는 중인” 저 광장의 사람들에게 그 글의 마지막 몇 문장을 전하고 싶다.
“시절은 불안을 향해 나부끼는 깃발 같아서 어떤 침묵으로도 잠재울 수가 없다.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길까./ 사랑하는 당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아 비루하고 구차한 생의 마지막에 그래도 빛나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줄임) 그래도 말하고 싶다. 염치없지만, 혁명하자고./ 게처럼 기어서 바다 끝까지 가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