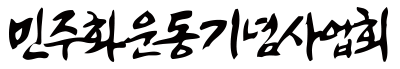비념 | 제주의 봄은 푸르지 않다
글 성지훈/ acesjh@gmail.com

봄날의 제주도는 푸르지 않다. 봄이면 제주도 온 땅이 제사를 지낸다. 사실 제주도 땅 어느 곳도 무덤 아닌 곳이 없다. 어느새 70년이 지났지만 잔인했던 제주의 4월은 여전히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한 줌 흙에, 나무에, 바람에, 사람에. 한 집 건너 한 집, 비밀과 사연이 없는 집이 없다. 원망과 회한, 보고 싶지 않은,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기억들. 그래선지 한라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제주 4.3평화공원에는 안개가 자주 낀다.

# 망자의 시선
<비념>은 영화를 제작한 김민경 PD의 가족사에서 시작한다. 김민경 PD의 외할아버지 김봉수 씨는 4.3 당시 빨갱이로 몰려 총살당했다. PD의 증조모는 젊은 아들을 잃은 충격에 정신을 놓았고 곧 아들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김 PD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가족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증조모의 이야기에 대해 집안 어른들로부터 한 번도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은 묻지 않으면 어른들이 먼저 얘기해주기는 어렵죠”. 김 PD의 외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고 친정에 의탁해 딸을 키웠다.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잔혹했던 기억과 함께 깊은 곳에 묻어뒀다.
새로운 영화를 구상 중이던 임흥순 감독과 집안의 ‘비밀’을 이야기 하던 김민경 PD는 감독과 함께 제주로 내려와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온 이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김 PD의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는다. 오랫동안 묻어뒀던 그 곳을 10년 만에 찾는 할머니는 남편의 무덤을 잘 찾지 못한다. 그만큼 잊고 싶었던 기억. 소개한 적 있는 다큐 <할매꽃>의 이야기와도 비슷하다. <할매꽃>의 문정현 감독도 좌우의 이념갈등에 온 가족이 희생된 역사를 다 큰 어른이 될 때까지 몰랐다.

전쟁과 이념갈등, 권력의 학살이라는 끔찍이도 우스운 역사는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켠에 올올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개인의 미시적인 역사는 곧 세상의 거대한 역사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사연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 곧 역사다.

그리고는 부유하는 망령이 제주의 중산간에서 강정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카메라의 시선이 이동한다. 그곳에서 카메라는 구럼비 바위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싸움을 비추고 구럼비 바위에 얽힌 전설을 들려준다. 오키나와로 피난간 한국인들의 공연, 그리고 해군기지와 관련된 보도 영상과 주민들의 대화를 들려준다. 나아가선 정부 관련 인사들이 언론을 통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를 진술하는 장면들을 보여준다. 이것들을 전부 보여주고 나면 카메라의 시선을 따르던 관객은 4.3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생명.

# 비나리, 죽은 자와 대화하기
‘비념’은 무당 한사람이 방울만 흔들며 기도하는 작은 규모의 무속 의례다. ‘비나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영화는 종이탈을 뒤집어 쓴 남자들이 굿거리장단에 맞춰 우울한 굿판을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영화가 죽은 것들을 위한 진혼곡이며 그 굿판은 떠들썩하고 거대한 것이 아닌 작은 방울과 기억에 의존한 비나리임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감독은 나라에서 벌이는 굿이야말로 작은 굿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개인과 개인, 산 자와 죽은 자의 소소한 관계맺음이야 말로 우리가 벌일 수 있는 가장 큰 굿이라고. 무당이 혼자서 망자들과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영화는 죽은 영들의 흔적을 추적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고 그것에 위로받고 기억하고. 마을에 대소사가 벌어지거나 철이 되면 크고 작은 굿판이 벌어지던 시대와 달리 현대의 굿은 ‘영화’일지도 모른다. 감독과 배우, 스크린은 일종의 ‘영매’같은 거다. 세계와 세계를 이어주는, 카메라의 이쪽과 저쪽을 모두 위무하는.
작은 굿판으로 시작한 <비념>은 김봉수를 기리는 ‘비념’이 끝난 후 앞마당에서 소지(燒紙)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검은 하늘에 점점이 오르는 불씨들. 카메라는 이 불빛을 응시한다. 조금씩 멀어지는 불빛들. 망자들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떨어져 있지만 다른 곳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이다. 비나리의 끝에 이어진 소지의 불빛이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 같은.
미술작가이기도 한 감독은 자신의 작품집 <비는마음>에서 하이네 밀러의 말을 인용한다. “죽은 것이라고 해서 역사에서까지 죽은 것은 아니다. 드라마의 역할은 초혼이다. 사자가 자신들과 묻어버린 미래를 우리에게 되돌려 줄 때까지 사자와의 대화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비나리로 이어지는 사자와의 대화.
그래선지 감독은 나라와 사회가 하는 기억을 작은 굿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개인이 작은 방울로 시도하는 비념을 큰 굿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벌이는 더 큰 굿. 사회와 사건의 연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우주와 우주의 연결.

# 거리두기의 방식
미술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임흥순은 근대의 척박과 정치적 풍경을 온갖 시각 매체를 통해 담아왔다. 그의 작업물은 친절하지 않고 내러티브에 충실하지 않기도 했다. <비념> 역시 서사보다는 이미지의 나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감독은 관객과 사건의 거리두기를 통해 오히려 관객들이 사건에 내밀히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
과거를 회상하는 인터뷰 장면에서도 화면은 인터뷰이보다 제주의 풍광을 담아낸다. 다분히 의도된 미장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장면들은 사건이 발생했던 공간과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공간의 불일치성. 그리고 자연의 기억이라는 거대한 주제의식과도 맞물린다. 인터뷰이의 신체 한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클로즈업도 마찬가지다. 인터뷰이의 표정, 눈물에 현혹돼 관객의 공감을 쥐어짜는 ‘인각극장류’의 다큐와는 차별화 되는 감독의 연출인 것.

# 무엇을 할 것인가
<비념>은 임흥순이 카메라라는 요령을 들고 벌인 비나리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제주의 뭇 생명들, 과거에 죽은 것들, 앞으로 살아갈 영령들에게 말을 걸었고 관객과의 대화를 주선했다. 현대적 의미에서 굿이랄 수 있는 영화의 역할에 충일했다.
무당은 산 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다. 그 경계에 서서 둘을 연결시켜 줄 뿐이다. 죽은 자를 불러오는 건 무당이지만 죽은 자의 한을 풀고 그를 기리는 건 산 자의 정성이다. 영매 임흥순은 비나리를 통해 제주의 죽은 넋들을 불러왔다. 그래서 이제 산 자의 차례. 여전히 제주에 어느 바람으로 흙으로 남아있는 망자와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달래고 기억하며 또 함께 살아갈 것인가. 강정에는 해군기지가 결국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