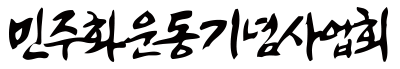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택시블루스> - 서울의 묵시록, 그럼에도
<택시블루스> - 서울의 묵시록, 그럼에도
글 성지훈/ acesjh@gmail.com

# 삶의 고단함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에는 7만 여대의 택시가 있다. 서울 인근의 위성도시들의 택시도 서울에서 영업을 하니까 서울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택시와 택시기사와 승객이 있다. <택시블루스>의 감독 최하동하는 그 7만대의 택시 중 하나를 탄다. 승객이 아니라 기사로. 나중에 밝힌 이야기지만 그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택시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택시를 몰았다고 한다. 하지만 하루에 12시간이 넘도록 운전을 해도 사납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나면 몇 푼 남는 것도 없었다. 감독은 다리도 채 펴지지 않는 고시원에 살면서 운전시간을 늘려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했다. 그는 택시를 몰며 수많은 군상을 봤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삶이 고단했던 노인, 매맞는 아내, 술에 취한 사람, 매춘부, 매춘부를 애인으로 둔 남자. 그리고 가난하면서도 그들을 관찰하고 있는 감독 자신까지. 감독은 택시 안에 6mm카메라를 설치했다.

서울은 복잡한 도시다. 낮에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도로 위를 가득 채운다. 사람들은 늘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 하루에도 수십명의 사람을 만나고 셀 수도 없는 돈이 움직인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변에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다.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강변에 앉아서 사랑을 속삭인다. 택시를 타고 서울 이곳저곳을 누비면 이런 광경들을 볼 수 있다. 밤의 서울은 화려하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속내에는 괴로움이 있다. 그들은 낮에 바삐 걸으며 전화하던 직장상사를 욕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하는 자신의 가난을 한탄하고 떠나버린 사랑을 그리워하거나 저주하고, 사랑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비참해한다. 폭력은 늘 삶에 덧씌워지고 가난이 그 폭력을 엄호한다. 택시의 뒷자리, 아니면 조수석에는 그런 삶의 상흔들이 남는다.
카메라에 담기는 것은 승객들만이 아니다. 앵글은 택시를 몰고 있는 감독을 함께 잡고 있다. 감독 역시, 그러니까 가난해서 택시를 몰아야하는 영화감독, 취객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승객들을 연민하고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면서 끝내 영화를 만들겠다고 택시 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감독 역시 그 택시에 탄 승객들과 함게 포착하고 있다. 감독은 관찰자로서 영화밖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살아가는 군상의 일원으로 앵글 안에 존재한다. 6mm 카메라로 찍은 화면을 스크린 용으로 변환한 까닭에 화면은 매우 거칠고 어둡다. 조명도 없는 밤의 택시 안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화면은 택시 안의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게 한다. 화려한 마천루의 도시 서울에서 어둡고 거칠게,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둡고 거칠고 외롭고 가난한 감독의 택시안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삶을 재현한다.

택시에 승객이 타면 기사는 묻는다. “어디로 가세요?”. 가끔 술취한 승객들은 말도 없이 골아떨어지거나 “모른다”고 대답한다. 기사로서는 난감한 순간. 기사도 승객도 모두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는 그 순간.
# 재현과 재연
<택시블루스>가 개봉했을 당시 모큐멘터리 논란이 일었다. 감독이 촬영한 모든 장면을 영화에 쓰지 못하면서 일부 배우들의 재연 장면이 들어간 것이 논란의 원인이다. 그러나 실제 촬영된 장면과 재연된 장면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다. 어느 장면을 재연을 했는지, 얼만큼의 분량을 재연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사실 영화에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심지어 영화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의 콘티화면을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이 다큐멘터리의 본령을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이다. 더 엄밀히 다큐멘터리의 ‘원칙’따위를 말한다면 카메라의 존재를 알고 있는(6mm 캠코더는 몰래카메라가 아니다. 심지어 감독은 승객들에게 카메라로 촬영 중임을 설명하고 양해를 미리 구한다.) 승객들의 대화가 가감없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건 차라리 인터뷰에 가깝다. 감독의 의도는 기사의 눈과 귀, 그와 같은 역할을 카메라가 해주기를 바라는 데 있다. 서로의 삶을 엿보고 있음을 인지한 상황에서 나눠지는 대화와 대화들.
# 소외

늦은 밤의 택시라는 공간은 서로의 삶을 엿보는 시간이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거나 위안을 느끼거나 조롱하면서.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서로 보이고 싶은만큼 솔직하고 싶은만큼 자기의 세계를 전시하고 타인의 세계를 엿본다. 영화를 내내 관통하는 정서는 ‘엿보기’다. 감독은 승객들의 삶을 엿보고 택시 안에서 서울의 속살을 엿본다. 카메라는 감독의 삶도 엿보기 시작한다. 감독이 혼자 사는 고시원의 CCTV, 감독의 택시 회사. 심지어는 감독의 성매매 장면과 고단하고 지루한 섹스까지도.
그러나 엿보기는 소통이나 관계맺기일 수 없다. 엿본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소외를 의미한다. 단절과 배제를 전제로 한 관계. 서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은 택시기사와 승객의 관계이기도 하면서 서울과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그보다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서로와 맺고 있는 관계기도 하다.
# 그럼에도
그러나 영화에는 단 한순간 승객과 기사가 서로를 엿보는 단계에서 넘어서는 순간이 있다. 감독인 기사와 술 취해 쓰러져 있던 승객이 인간으로 소통하는 장면. 가난한 화가였던 승객은 감독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초대한다. 그의 삶은 역시 가난하고 우울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림을 사랑하고 그 그림을 감독에게 보여주는 일을 사랑한다. 초대를 받고 어리둥절하던 감독은 그 가난한 화가의 그림들을 보고 칭찬하고 진심을 다해 감상한다. 내도록 우울하고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도록 암울하던 영화에서 이 장면 만큼은 따뜻하다.
근래 한국의 다큐맨터리나 영화들은 가난을 전시하고 우울함을 조장한다. 그건 사실 또다른 착취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 공모된 '가난과 파국의 소비‘에는 정작 당사자들의 이해가 결여돼 있다.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희망의 마지막 끈을 거머쥘 수밖에 없는 그 당사자들의 마음에 관한 사유가 결여된다. 그저 장르적으로 그 고통을 전시함으로서 착취하는 것. 그러나 모든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본령은 ’그럼에도 거머쥘 수밖에 없는 희망의 마지막 끈‘에 있다.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 해요.”

가난한 화가와 가난한 영화감독이 만난 그 짧은 순간은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우울하고 괴로운 화면의 연속에서 마지막으로 감독이 쥐어든 희망의 끈과 같았다. 이 영화는 우울한 인생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아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감독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택시 보다는 서울에, 블루스 보다는 묵시록에 가깝다고 말했다. 서울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서울의 속내는 그런 화려한 불빛이 아니다. 그건 일종의 기만책이다. 영화는 그들이 살아내는 도시적 삶과 종속당한 일상의 풍경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어쩌면 ‘기록영화’에 가깝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21세기 초반의 서울의 모습을 발견할 기록으로서의 영화. 재연은 그 기록의 정밀함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1세기의 서울을 반추했을 때 후일의 그들이 비참하고 우울하고 가난하고 슬픈 서울의 군상들 속에서 그럼에도 영화를 찍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내려’했던 이들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