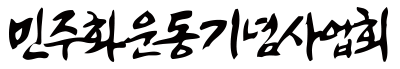야수의 세월을 날아가는 도요새의 날갯짓
야수의 세월을 날아가는 도요새의 날갯짓
- 도종환 시 <화인> <도요새>
글 최규화 (인터파크도서 <북DB> 기자)/ realdemo@hanmail.net

기자란 참 비정한 직업이다. 지금은 정치․사회 기사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책 기자’이지만, 노동잡지와 인터넷신문에서 기자로 일할 때는 나도 그 비정함을 몸에 익혀야만 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얼마나 섭섭하게 들렸을까. 자기네 노동조합 투쟁을 취재해달라는 노동자의 전화에, 자기네 농성장에 와서 기사를 써달라는 전화에 나는 그렇게 되물은 적이 있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는 뉴스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미안한 기자들은 100일이니, 200일이니 ‘딱 떨어지는’ 숫자가 되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싸우는 사람들도 잘 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투쟁을 해야만 사람들이 눈길을 줄 거라는 걸. 그래서 더 비참해진다. 극한으로 내몰린다. 지금껏 해온 투쟁들보다 더 ‘빡세고’ 더 위험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린다. 이따금 신문에 기사 한 줄씩이라도 나야, 아직도 싸우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잊힐까봐, 그게 늘 두렵다.
화인(火印)
비 올 바람이 숲을 훑고 지나가자
마른 아카시아 꽃잎이 하얗게 떨어져내렸다
오후에는 먼저 온 빗줄기가
노랑붓꽃 꽃잎 위에 후두둑 떨어지고
검은등뻐꾸기는 진종일 울었다
사월에서 오월로 건너오는 동안 내내 아팠다
자식 잃은 많은 이들이 바닷가로 몰려가 쓰러지고
그것을 지켜보던 등대도
그들을 부축하던 이들도 슬피 울었다
슬픔에서 벗어나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섬 사이를 건너다니던 새들의 울음소리에
찔레꽃도 멍이 들어 하나씩 고개를 떨구고
파도는 손바닥으로 바위를 때리며 슬퍼하였다
잊어야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남쪽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지켜본 바닷바람이
세상의 모든 숲과 나무와 강물에게 알려준 슬픔이었다
화인처럼 찍혀 평생 남아 있을 아픔이었다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 화인 : 쇠를 불에 달구어 살에 찍는 도장.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제처럼 싸우고 있다. ‘아직도’라는 말로 반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비정하다. 심지어 그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그들은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배가 침몰하는 것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잊어야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도종환 시집 <사월 바다>(창비/ 2016년)의 114~115쪽에 실린 시다. 시집 제목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시를 찾아 읽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라는 비정한 말을 해대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랄까. 지금까지도 2014년 4월의 달력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 바다에 대한 시인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 역시 그 바다가 남긴 “화인처럼 찍혀 평생 남아 있을 아픔”을 또 한 번 직면하고 싶었다.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은 지금도 매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싸우고 있다. 백남기. 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올해 9월 25일 결국 숨을 거둔 농민. 그가 쓰러지는 장면을 방송 카메라를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지만, ‘피의자’인 경찰만은 사인을 알 수 없다며 부검을 고집하고 있다. 그에 발 맞춰 ‘사인은 병사’라고 주장하는 주치의, 극우 사이트에 떠도는 괴담을 그대로 따라하는 여당, ‘시체장사’를 그만하라며 핏대 세우는 극우단체, ‘백남기는 순수한 농민이 아니라 전문 시위꾼’이라며 붉은 색깔을 칠하는 언론…….
세월호 사건 이후 ‘노란 리본’을 향해 쏟아진 모욕과 왜곡, ‘색깔 칠하기’가 그대로 반복된다.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 어느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야만의 세월이 아니라 야수의 세월이다. 어떻게든 참고 버티면 이 세월이 끝날까. 내년에 대통령을 새로 뽑고 정권만 바뀌면 인간의 세월이 올까.
도요새
저기 새로운 대륙이 몰려온다
낯선 세상을 찾아가는 일이
우리의 일생이다
시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우주를 움직이는 힘은 거대하나 보이지 않으며
우리 각자는 한마리 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는 빙하가 녹는 여름의 북쪽까지 갈 것이다
연둣빛 물가에서 사랑을 하고 새끼를 키울 것이다
새로운 세상 어디에나
덫과 맹금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
생의 갯가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을 수 있고
이전에도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는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번개의 칼끝이 푸른 섬광으로 하늘을 가르는
두렵고 막막한 허공을 건너가지만
우직하게 간다는 것
날갯죽지 안쪽이 뜨겁다는 것
갈망한다는 것
우리가 도요새라는 것
생을 다 던져 함께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라는 것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도요새의 일생이라는 것이다
저기 또 새로운 대륙이 몰려온다
같은 시집 60~61쪽 실린 시다. 시인이 말하는 ‘비정한’ 깨달음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이전에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딘가에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머무른 곳을 향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것”을 계속할 때, 그 세상은 조용히 열리고 또 조용히 다가올 것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만 존재한다. “새로운 세상 어디에나/ 덫과 맹금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다”. 저기 몰려오는 새로운 대륙을 향해 “생을 다 던져 함께 도달하는” 도요새. 그 “날갯죽지 안쪽”에서 인간의 세월은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