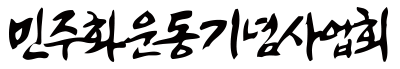일상의 언어로 쓰인 ‘스며듦’의 신화
일상의 언어로 쓰인 ‘스며듦’의 신화
박성우 시 <고추, 우선 도로> <콩>
글 최규화 (기자)/ realdemo@hanmail.net

지난 추석 때의 일이다. 이번에는 모처럼 지하철로 처가에 가기로 했다. 네 살 첫째는 유모차에 태우고, 두 살 둘째는 아기띠로 안았다. 처가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지하철을 갈아타고 가니 한 시간 정도 걸렸다. 가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연휴 중이라 지하철 안에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고, 유모차가 자리를 차지한다고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었다.
문제는 지하철역을 빠져나와서 발생했다. 울퉁불퉁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 때문에 유모차가 덜커덩거린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화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인도를 완전히 막아버린 자동차들이었다. 두 대의 자동차가 인도 위에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인도 끝에는 전봇대도 서 있었고, 차량의 진입을 막는 볼라드도 두 개나 설치돼 있었는데 어떻게 인도로 들어갔을까 신기하기도 했다.

인도는 어른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남아 있었다. 이곳에 주차를 한 운전자의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뭐 사람 지나갈 수 있으니까 됐네.’ 하지만 두 발로 걷는 사람만 사람인가. 유모차를 타는 아이도 사람이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사람이다. 운전자가 ‘사람 하나는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남겨 놓았을 공간은 전봇대와 볼라드로 막혀 있었다. 결국 유모차는 차도로 내려가야 했다.
벌써 해도 떨어진 저녁 시간. 어른도 차도로 걷는 것이 위험한데,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가지고 차도로 걸어야 하다니.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우리를 보지 못하고 달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무서웠다. 아내는 차도 뒤를 살피고, 나는 유모차를 밀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지나가야 했다.
고추, 우선 도로
볕 따가운 오후에 집으로 든다
널찍널찍 널린 붉은 고추가
집으로 드는 길을 막고 있다
아, 그새 고추 딸 때가 되었구나,
집으로 드는 길목에서
후진으로 차를 뺀 나는
고추가 차지하고 있는 길
가장자리로 걸어서 집으로 든다
그래, 가을엔 고추가 우선이지
해마다 이맘때 길은 고추의 것,
고추가 십년 넘게 이 길을 써왔다
그래, 우리 집으로 드는 길목은
옅은 경사가 있어 볕이 그만이지
우리 집으로 드는 길목에는
우리 집밖에 없어 딱히
누군가 들락거릴 일도 없지
아 참, 한사람 있기는 있다
우체부 아저씨도 당분간은
고추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조심조심 걸어들어와
편지함에 우편물을 넣고 가겠다
박성우 시인의 시집 <웃는 연습>(창비, 2017년) 58~59쪽에 실린 시다. 집으로 들어가는 시인의 차를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고추다. 볕 좋은 오후, 누군지 모를 이웃이 널어놓은 고추. 시인의 마음에도 순간 ‘아니 차가 가야 되는 길에 누가 고추를 널어놨어!’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인은 금세 떠올린다. 가을 길은 고추의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그래, 가을엔 고추가 우선이지”라며 “후진으로 차를 뺀” 뒤 “가장자리로 걸어서 집으로 든다”. 흔쾌히 불편함을 선택한다.
길은 누구의 것인가. 자동차의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것이다. 때로는 유모차 것이기도 하고, 가끔은 휠체어의 것이기도 하다. 어느 때는 우체부 아저씨의 오토바이나 종이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의 것이 되기도 하고, 볕 좋은 가을날에는 고추까지 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낙엽의 것이 되는 날은 또 없겠나. 시원한 그늘의 것이 되는 날도 없으란 법 없다. 길은 모두의 것인 동시에 누구의 것도 아니다. 길은 ‘이웃’의 것이다.
시인은 자신의 집 앞 길을 자신의 자동차 대신 고추에게 양보했다. 그것은 사실은 고추를 널어놓은 이름 모를 이웃에게 양보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작은 불편함을 감수한다. 불편함을 견디고, 이웃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의 마음을 끌어안으며,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다. 시집 <웃는 연습>에는 이웃과, 자연과, 세계와 서로 스며들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 가득하다.
콩
유월 여드레, 좀 늦긴 했으나
콩을 대여섯알씩 텃밭에 묻었다
들락거리는 멧비둘기가 많아
콩을 한두알씩 더 보태 심고는
텃밭 위 이팝나무와 화살나무 사이에
대나무 장대 걸고 빨래를 걸어두었다
빨래는 성실한 허수아비가 되어
멧비둘기가 오는 것을 몇날이나 막았다
콩은 떡잎을 벌리는가 싶더니
줄기와 새순을 다부지게 밀어올렸다
올해는 콩 농사 제법이겠구나,
밤마다 고라니가 내려와 연한
콩 순만 골라 똑똑 따 먹고 갔다
순을 죄 뜯긴 콩 줄기는
그야말로 볼품없이 앙상해 보였다
그렇다고 해도 어찌할 방법은 없었으나,
장맛비가 지나갔고 못 봐주겠다던 콩은
겉줄기를 두배로 뻗어 무성해졌다
어느 폭설 밤에 고라니가 찾아와
콩 순을 따 먹은 게 아니라 밤마다
콩 순지르기를 하고 간 거라고, 끄먹끄먹
밀린 품삯을 내놓으라 하면 나는
콩을 몇됫박이나 퍼주어야 하나?
<웃는 연습> 30~31쪽에서 찾은 시. “멧비둘기가 오는 것을 몇날이나 막”으며 간수한 콩 밭. “올해는 콩 농사 제법이겠구나” 기대했지만 “밤마다 고라니가 내려와 연한/ 콩 순만 골라 똑똑 따 먹고” 가버렸다. 시인이라고 왜 허탈한 마음이 없었을까. 하지만 웬걸, 고라니가 뜻밖의 순지르기를 해준 덕에 콩은 “겉줄기를 두배로 뻗어 무성해졌다”. 고라니에게 줘야 할 품삯을 걱정하는 시인의 마음이 참 포근하다.
1주일에 2회 이상 버스를 탄다는 E 씨는 “버스 탈 때 앞문으로 꼭 승차하라고 하니까 아기띠 해서 아이를 안고, 유모차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앞문으로 타서 카드를 태그하면 바로 차가 출발한다. 아직 앉지도 못했는데”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릴 때도 짐 잡아야지, 아기가 보채기라도 하면 아기띠 해야지, 유모차 한 손에 들어야지, 그러면 기사아저씨가 ‘아기 엄마 빨리 안 내리고 뭐해요? 준비 안 했어요?’라고 한다.” - <유모차로 버스 타기? "한국에선 욕만 먹어요"> 2017. 10. 21. 베이비뉴스
<웃는 연습> 속 이야기들은, 우리가 겪는 현실에 비춰볼 때 어쩌면 ‘신화’와 같이 들릴지도 모른다. 빨리 빨리 달려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모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 ‘작은 것’, ‘약한 것’, ‘다른 것’과 길을 나눌 줄 모르는 사회. 그들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지 못하는 사회.
지난 추석 내가 본 장면과 신문기사 속 아이 엄마의 이야기가 박성우 시인의 시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한 권의 시집 속에 담긴 스며듦의 신화 속에서 작은 위안과 작은 기대를 동시에 읽는 가을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