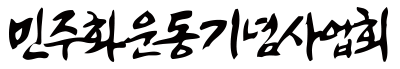악마를 만드는 사회 괴물을 키우는 학교
악마를 만드는 사회 괴물을 키우는 학교
박일환 시 <반성문> <잡초를 뽑으며>
글 최규화 (기자)/ realdem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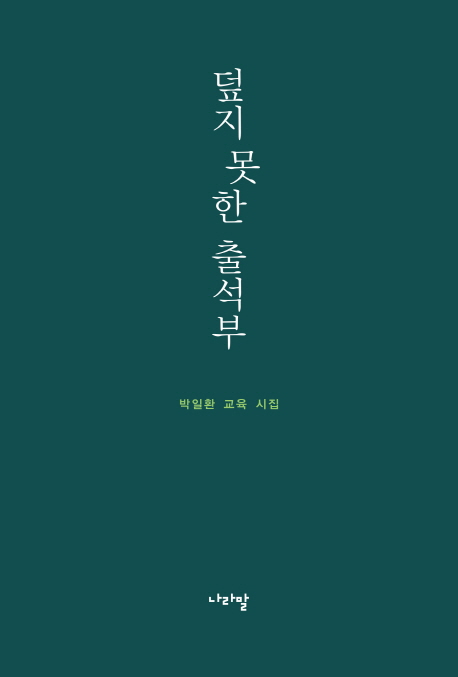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범죄가 점점 흉포화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 규정은 중·고등학생들의 심각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하태경 국회의원)
“최근 발생하는 미성년 범죄사건을 보면 성인 범법자 못지않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 등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전혜숙 국회의원)
최근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소년법. 만 10~13세 소년은 형사 책임 대신 보호처분만 내려지고, 만 18세 미만에 대해선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처해야 할 경우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형량 완화 특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의 ‘특별조치’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월 초 세상에 알려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강릉, 아산 등 청소년 폭력의 다른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그에 발맞추듯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만 모두 여덟 건의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모두 같다.
인터넷 공간의 여론을 보자. 청소년 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미 ‘악마’와 같은 비난을 받고 있다. 모두가 서슴지 않고 돌을 던지는 ‘괴물’이 돼 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흉포한” 폭력에 대한 놀라움과 분노의 표현이라 십분 이해되고도 남는다. 비난은 쉽다. 그리고 처벌은 편리하다. 하나하나의 ‘사건’만 본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처벌뿐인가.
반성문
선생님, 이건 비밀인데요. 어제 진수가 유리창을 깼다고 자수했잖아요. 그런데 범인은 진수가 아녜요.
누가 깼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수가 아닌 건 분명해요. 진수는 그냥 자기가 뒤집어쓴 거예요. 안 그러면 종례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이건 선생님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차라리 깨진 유리창을 혼냈으면, 싶은 날이 있다.
박일환 시인은 30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사다. 그가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며 펴낸 <덮지 못한 출석부>(나라말, 2017년)는 그동안 써온 교육에 관한 시들을 모은 교육시집이다. <덮지 못한 출석부> 16쪽에서 읽은 ‘반성문’이라는 시는 최근의 청소년 폭력과 소년법 개정 등의 논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일깨워준다. 바로 법이나 정의의 시각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교육’의 시각 말이다.
폭력사건이란 말은 ‘폭력’과 ‘사건’으로 이뤄져 있다. 그중에서 ‘사건’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교육의 시각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생각돼야 할 것은 ‘폭력’이다. 그들의 폭력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처벌을 강화하자고만 목소리 높이는 것에는, 누구든 유리창을 깼다고 빨리 자수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편리한 마음이 들어 있지는 않나. 누구든 어서 범인을 찾고 벌을 줘서 사건을 끝내고 싶다는 손쉬운 마음이 들어 있지는 않나.
교육은 ‘사건’의 범인을 찾는 것이 목표가 돼선 안 된다. 교육은 ‘폭력’의 원인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개인, 학교, 사회, 폭력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박일환 시인이 먼저 쓴 반성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육의 시각을 일깨워준다. “차라리 깨진 유리창을 혼냈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인터넷에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카페가 생겼다고 한다. 그 카페의 회원들은 9월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도 벌였다. 9월 8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하여 성인과 동일한 처벌에 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법정서’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점에서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런 조치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폭력사건에서 ‘사건’이 아니라 ‘폭력’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이야기를 앞서 한 바 있다. 그 폭력의 출발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학교와 사회, 가정과 친구관계 속까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폭력의 문화, 폭력의 관계다.
잡초를 뽑으며
아직 콧수염도 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데리고
잡초를 뽑는다.
뿌리째 뽑힌 잡초는 그냥
화단 안에 던져져
볼품없이 시들어 가고
지금 잡초를 솎아내는
저 귀여운 녀석들 중
언젠가는 잡초처럼 뽑혀 나갈 운명도
더러는 섞여 있을 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몸에 익을수록
잘 다듬어진 화초에만
눈길이 가 닿는 건 아닐까?
손길은 자꾸만 더뎌지고
마음만 저 홀로 바쁜
오후의 풀 뽑기 작업.
<덮지 못한 출석부>의 52~53쪽에 실린 시 ‘잡초를 뽑으며’는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육자의 고민을 잘 보여준 시다. 쓸모 있는 작물과 버려야 할 잡초를 가려내는 것은 우리 교육의 특기다. 수많은 시험과 평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 아닌가.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서 작물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갈라놓는 것은 우리 교육의 장기다. ‘한 번 뽑혀나가면 인생 끝난다’는 공포는 그렇게 심어진다.
떨어뜨리고 솎아내고 걸러내기만 하는 교육. 경쟁을 통해 더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것만이 미덕이 되는 학교. 그리고 그 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곳에 선 사람이 낮은 곳으로 뽑혀나간 사람을 부려먹고 우롱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사회. 모두가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모두가 그렇게 높은 곳에 오르기를 부러워하는 불편한 진실. ‘폭력’이 ‘실력’과 동의어가 되는 사회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리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폭력의 문화와 폭력의 관계 속에서 폭력은 학습된다. 누구 하나 ‘약한 아이를 때려라’라고 말로 가르치지 않았겠지만, 아이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숨 쉬는 이 사회의 공기 속에서 이 사회의 ‘공식’을 몸에 익힌다. ‘사건’이 아니라 ‘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폭력의 문화와 폭력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처벌만큼 편리하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악마로, 괴물로 만드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 손을 털 것인가. 지금 인터넷에서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저주의 말들과 ‘신상털기’와 같은 보복들을 보며 나는 또 다른 방향으로 엄존하는 폭력의 공기를 느낀다. 소년법 개정 목소리는 당연히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분명히 더 높아져야 한다. 사건이 아니라 폭력을 해결하려는 목소리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