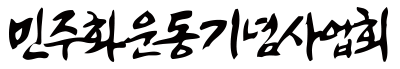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자유한국”의 코미디 앞에, 희망은 없다
“자유한국”의 코미디 앞에, 희망은 없다
송경동 시 <공구들> <막차는 없다>
글 최규화 (기자)/ realdemo@hanmail.net

“나라는 망조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이와 같은 퍼주기,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을 내걸고 쓰기 시작하는 돈을 철저히 막아서 나라가 사회주의 초입에 서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초입에 선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보니, 11월 13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국회는 12월 초까지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예산안 총액은 약 429조 원. 그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46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났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총액의 3분의 1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걱정을 조금 더 들어보자. 그는 “3조 원을 들여서 최저임금을 보전한다. 1조 7천억 원 들여서 기초연금을 늘린다. 1조 1천억 원 들여서 아동수당을 새로 시작한다. 건강보험도 3조 7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라고 몇 가지 예산 항목을 직접 열거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쓰일 예정인) 돈을 철저히 막아서 나라가 사회주의 초입에 서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구들
퇴근 무렵
지상으로 올라와 공구를 챙기는데
두개골이 삐쩍 마른 오십 대 중반의 사내가 다가와
혹시 사람 안 쓰는게라? 하고 묻는다
일용으로 질통과 곰빵은 져 봤지만
시골서 농사만 지어 용접도 제관도
토목일도 해 본 적 없다 한다
곰빵은 힘들던가요 물으니 그렇더라 해서
이곳 일은 더 위험하고 힘든데 하겠어요 하자
갱조개 같은 입술을 질근 물고
핏기 없는 눈에 힘을 불끈 주며
무슨 일인들 해야지라 한다
작업반장에게
내 조 조공으로 붙여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됐는지
해질녘 미등을 켜고 달리는 차들 사이로
멀어지는 그의 가는 어깨가 더 늘어져 있다
2006년에 나온 송경동 시인의 첫 시집 <꿀잠>(삶이보이는창, 2011년 개정판 출간) 17쪽에 실린 시다. 의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지만, “두개골이 삐쩍 마른”이라는 묘사가 그 사내의 처지를 보여준다. “핏기 없는 눈에 힘을 불끈 주며/ 무슨 일인들 해야지라” 하고 안쓰러운 결의를 세우는 것은 무슨 대단한 과업을 위함이 아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도 사내에게는 그만큼의 독기가 필요하다.
이 나라에서 노동으로 먹고사는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저 사내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32.9%. 그들의 월 평균임금은 157만 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인 284만 원보다 127만 원 적었다. 2004년 8월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 평균임금 격차가 62만 원이었지만, 13년 만에 그 ‘상대적 빈곤’의 틈은 두 배 이상 벌어졌다.
특히 13.4%를 차지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80만 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임금보다 무려 204만 원 적었다. 일터를 기웃거리며 “혹시 사람 안 쓰는게라? 하고 묻는” 저 사내와 같은 사람들이, 4차산업혁명이 어쩌고저쩌고하는 2017년 지금, 정규직보다 한 달 평균 127만 원을 적게 받으며, “해질녘 미등을 켜고 달리는 차들 사이로” 가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걷고 있는 것이다.
막차는 없다
비 그치고
막차를 기다리고 선 가리봉의 밤
차는 오지 않고
밤바다 쪽배마냥 작은 리어카를 끌고 온
한 노인이 내 앞에 멈춰 선다
그이는 부끄럼도 없이 휴지통을 뒤져
내가 방금 먹고 버린 종이컵이며
빈 캔 따위를 주워 싣는다
가슴 한 가득 안은 빈 캔에서 오물이 흘러
그의 젖은 겉옷을 한 번 더 적신다
내겐 쓰레기인 것들이
저이에게는 따뜻한 고봉밥이 되고
어떤 날은 한 소절의 노래
한 잔의 술이 되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목이 메인다. 눈물이라도 돈이 된다면
내 한 몸 울어줄 것을. 어둔 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섰는가
저기 두 눈 뜨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선
내가 실려 가는데
저기 두 눈 뜨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선
한 세월이 멀어져 가는데
같은 시집의 36~37쪽에서 읽은 시다. 우리의 일상에서, “밤바다 쪽배마냥 작은 리어카를 끌고 온/ 한 노인”은 얼마나 흔한가. OECD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로, OECD 평균인 10.6%의 4배다. 그리고 7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60.2%로, OECD 평균인 14.4%의 4.2배에 이르렀다.
이런 숫자는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또 하나의 불명예를 설명해주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55.5명. OECD 평균의 3배를 넘는다. 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노인 가운데 40.4%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다.
그 밤 휴지통을 뒤지는 노인은 곧 ‘나’다. 한 평생 “두개골이 삐쩍 마른” 몸으로 “핏기 없는 눈에 힘을 불끈 주며” 생존해온 ‘나’들은, “두 눈 뜨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선” 채로 “한 세월이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10만 명 중 55.5명”은 비정한 삶과의 인연을 스스로 놓아버리기도 하고.
11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는 이 모든 비참한 숫자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삭제했는지 보여준다. 국민들에게 물었다. 일생 동안 노력한다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65%가 ‘가능성이 낮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본인이 아니라 자식은? 55%가 ‘자식 세대에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대답했다. 한 방울 희망까지 증발해버린 사막 같은 시대다.
노인에게 “막차는 없다”. 쓰레기를 모아 “따뜻한 고봉밥”을 삼고, “한 소절의 노래”를 삼고, “한 잔의 술”을 삼는 노인을 보며, 시인은 “눈물이라도 돈이 된다면/ 내 한 몸 울어줄 것을” 하고 후회한다. 그에게 쥐여줄 돈은 없으니 그를 위해 눈물이라도 흘려주고 싶은 가난한 시인의 마음.
저 “자유한국”의 전사들은, 총액 429조 원이나 되는 예산안 중에서도 최저임금 보전에 드는 돈, 기초연금에 드는 돈, 아동수당 도입에 드는 돈, 건강보험에 드는 돈만은 ‘열과 성을 다해 막겠다’고 한다. 재벌에게 퍼주는 돈은 ‘투자’가 되고, 국민에게 퍼주는 돈은 ‘망조’가 되는 이유는 뭘까. 잠자던 “사회주의”까지 들고 나온 그들의 코미디 같은 신념 앞에 여전히, 희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