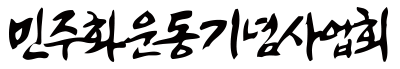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
 |
|
지난여름,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세트장 맞은편, 독특한 간판 하나가 눈길을 끈다.
볼펜으로 낙서한 듯한 간판에 노래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주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얼굴과 더불어 ‘클럽’, ‘빵’, ‘예술’, ‘음악’, ‘안드로메다’ 등의 글자가 보인다.
간판만으로는 이곳이 뭐하는 데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곳, 여기가 ‘홍대 앞’에서 꽤 유명한 ‘빵(bbang)’이다.
클럽? 카페?
대안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
‘빵’은 1994년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다. 처음 신촌역 근처에 둥지를 틀었던 ‘빵’에서는 연극, 춤, 퍼포먼스, 파티 등이 펼쳐졌고, 다양한 활동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간에 모이고 만나고 교류했다.
요즈음도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저녁에는 다양한 젊은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는 독립영화상영회를 개최하고, 재기발랄한 젊은 작가들이 전시회를 열고, 프리마켓 신입 작가들의 모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공간을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난감했다.
“있어보이게 꾸밀 때는 복합문화공간 아니면 대안문화공간으로, 음악만 놓고 본다면 라이브클럽으로, 음악 외적인 활동들을 가볍게 이야기한다면 카페로 부를 수 있겠죠.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할까 고민이지만 마땅한 것이 없어요.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면 이름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또 그렇진 않거든요.”
|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김영등(40) 대표의 대답이다. 애써 물어본 사람을 살짝 기운 빠지게 하는 답이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다. 어떤 공간의 규정성이란 그 공간을 찾아오고, 모여서 뭔가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닐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안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공간, 개성 있고 새롭고 독특한 실험이 다채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는 2004년 홍대 앞으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의 활동이 담긴 컴필레이션 앨범 3집 ‘히스토리 오브 빵(History of Bbang)’이 발매되었다. ‘빵’을 대표하는 31팀의 31곡이 담긴, 100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한 이 앨범은 올해 최고의 음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이런 작업이 가능했던 건 홍대 앞의 대표적인 모던록 라이브클럽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빵’이 쌓아 온 내공의 힘일 것이다.

한창 공연 준비 중인 김영등 대표(가운데)와 밴드 멤버들 |
홍대 앞 문화의 변화와 공존
“홍대를 대표하는 공간이자 문화는 라이브클럽입니다. 2002년 월드컵 후에 댄스클럽들이 활성화되고 알려지면서 라이브클럽이 사라진 듯하죠. 이건 대중매체가 편식한 탓이기도 하지만, 라이브클럽 사람들이 초기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침체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 홍대 앞에서 여성들이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매스컴은 홍대 거리와 댄스클럽에서 흥청망청하는 일부 젊은이들을 보여주며 이것이 ‘홍대 앞’의 전부인양 떠벌렸다.
자유로운 예술의 거리로 인식되던 홍대 앞이 클럽, 향락 문화의 대표로 여겨지면서 홍대 앞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4년 ‘빵’이 홍대 앞으로 이사 올 때만해도 여기 다복길은 가장 조용한 길이었는데 작년부터 시끌벅적해졌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홍대 앞을 만들었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갤러리, 클럽처럼 사람들을 담는 그릇과 같은 공간들이 밀려나고 있어요. 작가의 작업실과 갤러리, 문화행사 기획단체의 사무실 등 많은 공간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갔죠.
|
그래도 여전히 홍대 앞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일을 벌일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예술가들의 공간이었던 홍대 앞에 ‘자본’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다. 홍대 앞에는 먹고 마시고 노는 댄스클럽과 예술가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문화공간이 혼재되어 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터부시할 게 아니라 두 문화가 공존하는 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인 지도 모르겠다. 서로 다른 두 문화도 결국은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경이고, 지금 홍대 앞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열린 공간, ‘빵’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모이고, 각자 개인의 개별 작업도 잘 되고, 모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활발히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작업이 만들어지는 공간인 ‘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개별화되어 있지만 좀 더 커뮤니티가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작년 8월 독립영화 감독들과 ‘빵’에서 공연하는 밴드가 함께 뮤직 비디오 작업을 했다고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는 ‘빵’이라는 공간만의 특성이 만들어낸, ‘빵’다운 실험이란 생각이 든다. 김영등 대표는 각자 바쁜 활동에 새로운 일을 함께 하기도 힘들고 재원 마련도 힘들지만, 이런 새로운 작업들이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빵’을 찾고 오고 싶지만 낯섦에 주저할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
|

`빵`이 무엇이든 새로운 실험이 가능한 공간이길 바란다는 김영등 대표
|
|
“누구든 환영합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쉽지, 누가 오는 게 싫지는 않거든요. 낯섦도 있겠죠. 처음엔 낯설겠지만, 무엇이든 처음은 그런 거 아닌가요? 괜찮은 경험이 될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풍경이 생기다
지난달 초의 토요일. 홍대 앞에서 열린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페스티벌)’을 구경하러 갔었다. 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하는 화창한 날씨 속에 페스티벌이 펼쳐진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거렸다.
엄마 손을 잡고 책 구경에 한창인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이 보기에 혀를 끌끌 찰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무심히 지나가는 젊은이,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짓고 책 고르기에 열심인 중년의 아저씨들까지 다른 모습만큼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홍대 앞이라는 공간에 모여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이 모이고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면, 서로의 다름에 벽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할 수도 있다. |
|

`빵`의 입구, 독특한 간판이 눈길을 끈다. |
홍대 앞의 진정한 모습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의 다름이 그 색을 잃지 않으며 공존하는 게 아닐까? ‘빵’이라는 공간 자체가 홍대 앞 문화의 진정성을 대표하는 공간 중의 하나란 생각이 들었다.
아직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걷기 좋은 가을 날씨를 뽐내는 주말에 혼자든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든 홍대 앞을 찾아보길 권하고 싶다. 놀이터에 펼쳐질 프리마켓도 구경하고, 갤러리에서 재기발랄한 신진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맛있다고 소문난 밥집에도 들러보고, 저녁 무렵엔 라이브클럽에서 음악에 취해보기도 하고……. 혹시 혼자라고 주저하지 마시길. 홍대 앞에선 혼자라고 이상한 눈길을 보내지도, 뭐라 하지도 않을 뿐더러 혼자 노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글 이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팀
사진 황석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보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