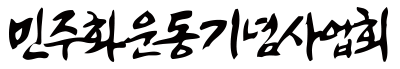서울 XXXX년 겨울
| |
| 1964년 겨울 | |
|
한일기본조약 반대와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은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면전에 나선 군사정부에 의해 패퇴했다. 그때 터진 사자후(獅子吼) 있어 소개하면 이렇다. “툭하면 한일회담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서두는 너, 제2의 이완용을 자처하면서 하겠다는 너, 말마다 방정맞게 ‘국운을 걸고라도 하겠다’는 너는 정말 이 나라의 정부(政府)냐? 왜(倭)의 정부(情婦)냐.”라는 말을 했던 이는 함석헌이었다. (1964년 4월호『사상계』 중 특집 ‘한일회담의 제 문제’에서 인용) 4·19가 열어젖힌 해방과 자유의 공간을 군홧발로 짓밟은 박정희 소장. 그를 상대로 한 싸움을 별러왔던 학생들의 반격이 6·3사태 또는 6·3항쟁으로 불리는 1964년 여름의 일이었다.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자 이제 학생들에게 남은 것은 개인 차원의 사소한 실천뿐이었다. 그것은 또한 재래적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단자(單子)적 세계관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그해 겨울엔 MBC사장이었던 황용주 필화사건과 리영희 기자의 조선일보 필화사건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횡포가 노골화된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온 글이 『무진기행』의 저자 김승옥이 쓴 단편 「서울 1964년 겨울」이다. 「서울 1964년 겨울」에서 포장마차에서 만난 세 남자는 독특한 동아리를 이룬다. 그들은 포장마차라는 동일한 공간에 각자 술을 마시러 왔다는 공통점으로 묶이지만, 그것이 어떤 유의미한 공동체의 형성에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세 사람은 각자의 고독과 상처로 자은 고치 속에 웅크리고 틀어 앉아 있을 뿐 고치 밖의 세계로 나올 염을 내지 못한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 이었다”는 지문(地文)은 그들이 함께 그러나 따로 든 여관방을 가리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 모두가 몸 부리어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사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김승옥의 단편 이야기인가? | |
| 1974년 겨울 | |
|
그로부터 10년 후인 1974년 겨울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해 겨울 마침 동숭동 대학가에서 김승옥의 그 단편이 연극으로 올려졌다. 당시 법대에 다니던 친구가 주인공인 세 남자 중 서적외판원인가로 나왔기에 구경 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그해 겨울의 기억은 동아일보와 떼어 놓을 수 없다. 당시 우리 집은 오래전부터 동아일보를 구독했고, 동아일보를 보는 것에 대해 일종의 자부심마저 느꼈던 시절이었다. 당시의 동아일보. 그 이름은 가히 어둠 속의 촛불이었다. 스스로를 태워 누리를 밝히던, 질식할 것 같던 군부독재시절의 숨통이었다. 하지만 그 신문을 중심으로 자유언론실천운동이 전개되자 12월 중순부터 정부 당국이 광고주들을 위협하여 동아일보에 싣던 광고를 중단시켰다.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그 신문사를 위한 독자들의 성금이 줄을 이었다. 성금을 내러 광화문 네거리를 건널 때 온 몸을 휘감던 그 해 겨울의 매서웠던 삭풍. 우리는 손 모아 간구했다. 제발, 제발 “씹히지 마라, 이빨 부러질 때까지”(이는 당시 격려광고에 실제 등장했던 말이다). 독재정권의 입속에 작고 단단한 돌처럼 존재하다가 정권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존재가 되길 염원했었다. 하지만 결국 경영주는 자유언론실천운동을 벌이던 기자들을 축출하고 스스로 권력의 주구가 된다. 1975년 무더기로 강제해직된 동아일보 기자는 무려 113명에 이르렀다. 김승옥이 그렸던 겨울의 서울 풍경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가차 없이 무자비했고 이성은 역사에서 퇴출당한, 지독히도 음습한 모습이었다. | |
| 그리고 2008년 겨울 | |
 | |
|
실개천의 물들이 모여 이윽고 장강으로 다시 대하로 흐르듯 많은 시간이 흘러 예까지 왔다. 70년대를 떠올리다 보면 가히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발전만을 계속한 것은 아니다. 역사가 발전만 계속한다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만개한 세상에서 과거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까마득한 흑백사진처럼 회고하며 살아가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천만에, 유감스럽게도,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다행스럽게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수백 년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자양분삼아 이나마 견고해진 것이라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이제 고작 반세기, 짧게 치면 20년을 갓 넘었으니, 아직 겪어야 할 수많은 역경과 우여곡절은 어찌 보면 마땅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아주 조금씩일지라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믿고 싶다). 얼마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기자해직사태와 관련하여 “중앙정보부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동아일보에 대해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무려 33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그들을 바람찬 거리로 내친 집단들은 묵묵부답이다. 그들에게 무얼 바란다면 그것을 일컬어 녹목구어(綠木求魚)라 할 것인가. 그래도 역사는 굼벵이만큼이나마 진전한다고 자족해야 할까? 뭔가를 처음 봤는데 이전에도 본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일컬어 데자뷔(dejavu), 또는 한자어로 기시감(旣視感)이라 한다는데, 왠지 요즘 일어난 세간의 일들이 과거 어느 시점의 반복이나 재탕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나만이 갖는 착시현상일까? 2008년에 맞는 겨울은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 | |
| 글·사료 어수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