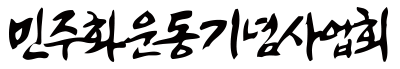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에 돌아보는 피식민의 흔적들과 `오늘`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에 돌아보는 피식민의 흔적들과 '오늘'
글. 사진 권기봉 (작가, 여행가)
지난 2009년 11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한 지 144년 만에 광화문 상량식이 열렸다. 조선 태조 4년에 경복궁 정문으로 들어선 광화문은 줄곧 서울의 역사적 중심지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경술국치 후 일제가 조선총독부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광화문은 경복궁의 동쪽으로 옮겨졌다가 한국전쟁 때 포탄을 맞아 소실되는 운명을 맞이하기도 하고 철근 콘크리트 시절을 거쳐 다시 고종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기에 이른 것이다.

네모난 담장 안에 원형 제단이 3단으로 쌓여 있고, 그 한가운데 원추형 지붕의 건물이 보이는 창건 당시의 환구단.
사진 왼쪽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 황궁우와 삼문이 보인다. /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3권
역시 고종 때 세운 환구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일제에 의해 황궁우 등 극히 일부 구역만 남긴 채 사라진 환구단은 정문도 없이 오랜 기간을 한 호텔의 조경시설인양 버텨와야만 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7년 우이동에서 정문이 ‘발견’되면서 2009년 원위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차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깃발을 올린 셈이다.
하지만 경술국치 이후 수난을 겪은 뒤 제 모습을 찾지 못한 문화재는 하나 둘이 아니다. 사유재산이 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어 원 모습을 갖출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2017년 오늘의 한국을 잉태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한 시대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뿔뿔이 흩어져버린 환구단
서울에 남아있거나 복원된 5개의 궁궐과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환구단(圜丘壇), 그리고 종묘와 사직 등을 두고 봉건왕조의 잔재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다. 반면 장구한 역사를 갖는 나라의 위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태나 의미가 타자(他者)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때 고민지점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일제는 환구단의 여러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경성철도호텔을 지었다.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3권
지금은 황궁우와 그 앞의 삼문, 그리고 석고와 돌난간이 남아 있는 것의 전부이지만, 1897년 완공된 환구단의 원래 영역은 지금의 웨스틴조선호텔과 롯데호텔, 프레지던트호텔 터를 아우를 정도로 광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열강의 각축 속에 왕실의 존속과 나라의 안녕을 고민하던 고종은 개혁정책을 통해 제국으로의 변화를 꿈꾸며 환구단을 세워 황제를 칭했고, 역사적 전통적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청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하였다. 고종은 이곳에서 황제즉위식을 거행하고, 민심을 앙양하기 위해서였는지 미뤄두었던 명성황후의 장례식도 이곳에서 국장으로 치렀다.
그러나 환구단의 영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현재의 롯데백화점 본점 뒤편 주차장 자리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석고각은 해체되어 남산 북동쪽 신라호텔 자리에 있던 박문사(博文寺)로 옮겨져 종루로 이용됐고, 석고각의 정문 광선문(光宣門) 역시 남산 북쪽 기슭의 경성 동본원사(東本願寺)로 옮겨져 정문으로 사용되었다. 박문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기 위해 1932년 건립된 사찰이며, 경성 동본원사는 1929년 정동 덕수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경성중앙방송국에서 최초의 ‘제야의 종’ 행사를 열 때 범종을 제공한 사찰이다.

우이동 그린파크호텔 터에서 발견된 환구단 정문. / 권기봉
파괴된 환구단 터에 들어선 것은 조선총독부립 경성도서관, 이른바 총독부도서관과 조선경성철도호텔이었다. 특히 조선경성철도호텔은 2만2천여 평방미터의 대지 위에 독일인 게오르그 데 라란데(Georg de Lalande)의 설계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들어섰는데 석재와 벽돌만 빼고 모두 외국산으로 지은, 근대화에 성공하여 서구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의 위상을 뽐내는 건물이었다. 황제국과 천황국 사이에 끼어 있다 비로소 황제국으로 거듭나고자 한 대한제국의 상징적 건물이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으로 뒤덮여 버린 것이다.
일제에 의해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해서 비극이 끝난 것도 아니었다. 재실 건물은 1960년대 말까지 ‘아리랑하우스’라는 간판을 내걸고 귀빈 음식점으로 이용됐고, 환구단의 정문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이동의 옛 그린파크호텔로 옮겨져 ‘백운문(白雲門)’이라는 편액을 걸고 호텔의 정문으로, 이어서 시내버스 차고지의 정문으로 이용됐다. 호텔 내에 ‘인수각’이라는 이름을 달고 음식점으로 사용되던 건물 역시 환구단 정문과 비슷한 시기에 옮겨온 점이나 당시 직원들의 증언, 단청 흔적과 대들보 규모 등으로 볼 때 재실 및 그 부속건물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경복궁 파괴와 함께 진행된 박람회
비단 환구단의 모습만 뒤틀린 것이 아니었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이 본격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사업이 시작된 1918년이 아니었다. 그보다 3년 앞선 1915년 9월 11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 그 개막은 경복궁 파괴와 궤를 같이 했다.

일제는 조선 5대 궁 가운데 하나인 경희궁의 정문 ‘흥화문’을 떼어다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박문사 정문으로 삼았다
이미 1862년 런던세계박람회 때부터 참관을 시작한 일본은 11년 뒤 비엔나를 시작으로 직접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데, 1877년부터는 일본 국내에서도 내국권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기 시작했고 1907년 들어서는 조선에서도 박람회를 연다. 통감부 총무장관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를 회장으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장장 75일 동안 지금의 을지로 일대에서 계속된 경성박람회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열린 최초의 박람회이다. 문제는 1915년에 들어서면서 박람회 장소가 오랜 기간 조선의 정궁 역할을 해온 경복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경복궁을 무대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는 일제가 조선 통치를 시작한 지 5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식민통치의 치적을 선전하고 일본 상공업인에게 조선의 사정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테면 경성박람회 때는 주로 일본 상품의 선전에 목적을 두었다면, 조선물산공진회는 위생이나 공업, 수산, 임업, 광업, 임시은사금사업 등 일제식민통치와 관련한 산업이나 행정 부분의 치적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1923년 열린 조선부업품공진회 때나 식민통치 20주년 즈음인 1929년 역시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박람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의도는 ‘조선왕조의 흔적 지우기’라는 면에서 서로 통하는 바가 있었다. 박람회를 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시관이 필요하다. 애초 ‘5보에 1루, 10보에 1각’이라는 말이 있듯 크고 작은 전각들로 빼곡했던 경복궁이지만 조선물산공진회 때 정전인 근정전과 편전, 침전, 경회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들, 즉 356동의 건물들이 헐려 없어지고 그 자리에 18개 동의 진열관이 새로 들어섰다. 이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동쪽 건춘문(建春文)에서 서쪽 영추문(迎秋門) 사이에는 횡단도로가 뚫렸고, 치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옮겨온 석탑과 부도 등이 잔디밭과 분수대에 놓여졌다.
전시 방식을 보면, 나무로 된 창고 같은 건물에 르네상스식 치장을 덧붙인 것이기는 하지만 일제의 물품들은 대부분 서구를 모방해 지은 건물에 집중 전시되었다. 반면 농기구나 어구, 원예품처럼 근대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조선의 전근대적인 물품’들은 근정전 행각에 배치해 전시했다. 이런 행사에 총독부는 기차 운임의 30%, 증기선 운임의 60%를 할인해 주는 등 조선인들의 관람을 적극 유도하여, 경성박람회부터 1940년 조선대박람회까지 4번의 박람회에 오간 연인원만 약 373만여 명에 달한다. 그곳에서 조선인이 대면하는 것은 결국 근대 일본과 전근대 조선의 모습이었다. 조선총독부가 각종 박람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왕의 공간인 근정전과 그 앞마당은 일제를 위한 각종 식장으로 이용되었다.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이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 등이 박람회 포상식을 하거나 훈시를 한 곳은 근정전 용상 자리에 마련된 단상 위였으며, 1921년부터 43년까지 민족해방운동가와 싸우다 죽은 일본 순사를 기리는 ‘순직경찰관초혼제’가 주로 치러진 곳도 바로 경복궁 근정전이었다.
일제의 조선 왕궁 파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선당(資善堂)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비현각(丕顯閣) 등이 잇는 동궁 일대를 밀어버리고 그곳에 총독부박물관을 세웠고,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 자리에는 총독부미술관을 건립했다. 이때 헐린 건물 가운데 세자와 세자비의 생활공간인 자선당은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라는 일본인에게 팔려 도쿄로 팔려갔는데, ‘조선관(朝鮮館)이라는 사설 박물관으로 쓰이다가 1923년 간토대지진 때 불에 타 주춧돌만 남고 모두 타버렸다. 1995년 12월 한국으로 환수되어 경복궁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쓸쓸히 놓여 있는 주춧돌이 이것들이다.
희화화된 창경궁과 아예 사라져버린 경희궁
경복궁이 파괴의 대상이었다면 창경궁은 희화화의 대상이었다. 1911년부터 해방이 되고도 한참 뒤인 83년까지 아예 ‘궁’ 대신 ‘원(園)’으로 불렸던 창경궁. 이토 히로부미의 심복이자 궁내부 차관이던 코미야 미호마츠(小宮三保松)의 제의로 이곳에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이 들어선다. 순종이 창덕궁에 있을 때 거의 한 궁처럼 여겨지던 창경궁이 행락 시설이 가득한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메이지정부가 에도에 입성한 뒤 도쿠가와(德川) 가문 쇼군들의 묘와 보리사인 칸에이지(寬永寺) 등이 있던 우에노 일대에 공원을 만들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세운 것과 비슷한 의미이다. 즉 옛 정치권력의 컬러를 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순종은 아직 그 공원 옆에서 엄연히 살고 있었다는 점이 다를 뿐….
1918년 1월 창경원을 찾은 영친왕은 “도쿄 동물원에도 없는 하마가 있다”며 신기해할 정도로 창경원에는 코끼리나 홍학 등 이국적인 동물들이 많았고, 유리 대온실을 중심으로 하는 식물원에도 진귀한 식물들이 여럿 진열되었다. 또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지은 자경전(慈慶殿) 자리에는 1911년부터 1992년 철거될 때까지 박물관으로 이용된, 마치 오사카성처럼 생긴 장서각(藏書閣)이 우두커니 서있었다.

일제는 조선 황실과 관련한 시설을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으로 만드는 등 철처히 희화화했다.
사진은 창경원에서 하마 사진을 찍는 영친왕.
1617년 창건된 경희궁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다. 거의 모든 건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지금이야 정문인 흥화문(興化門)이 다시 옮겨졌지만 그마저도 원래 위치가 아닌 데다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가 새로 지은 것들이다.
비극의 시작은 일제가 통감부중학교를 세우면서부터였다. 조선 말기 이미 왕궁으로서의 기능은 상당 부분 잃은 상태였지만, 궁 안에 일본인 자제들을 위한 경성중학교가 들어서면서 몇몇 남아있는 건물들마저 원 의미를 잃고 말았다. 정문인 흥화문은 환구단의 석고각처럼 박문사로 옮겨져 정문으로 쓰였고, 정전인 숭정전(崇政殿)과 회상전(會祥殿)은 남산에 있던 조계사(曹溪寺)로 이전되어 일본 사찰의 부속 건물로 사용됐다. 회상전은 주지 집무실로 사용되다 화재로 불타 사라졌고, 숭정전은 조계사 자리에 들어선 현 동국대학교 안에서 정각원(正覺院)이라는 편액을 내건 채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 제일은행 경성지점 건물이 들어선 달성궁(達城宮)과 대한의원 본관이 들어선 경모궁(景慕宮)과 함춘원(含春苑)까지…. 일제의 식민정책과 함께 스러져간 조선왕조의 건물들은 한두 개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는 옛스러운 표현으로 하자면 대한제국 선포 2주갑, 즉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대한제국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싶다. 그도 그럴 것이 제국이 내건 여러 개혁 조치들은 내외의 견제와 한계 탓에 좌절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으며, 해방은 되었으나 피식민과 관련한 역사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연거푸 독재정권들이 들어서며 오늘의 상황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탓이리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허망해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 조선 말기에는 동학 농민들이, 대한제국기에는 만민공동회가, 일제강점기에는 3.1독립만세운동을 위시한 민중의 수많은 저항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그리고 독재정권기에 학생, 시민들의 끊이지 않는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있는 곳이 또 이 땅이기도 하니 말이다. 또한 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지나간 시대의 치열했던 고민과 경험을 현재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도 감개무량해지는 대목이다.
2017년 오늘의 한국을 잉태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한 흔적들이 비록 황폐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즉 나라가 힘이 없을 때, 민중이 각성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사태로 치달을 수 있는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로서의 의미는 충분해 보인다. 이 봄,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아 피식민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오늘’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