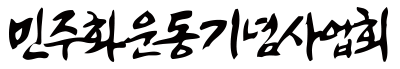이언주는 절대 모를 진실, ‘검은 가지’에 있다
이언주는 절대 모를 진실, ‘검은 가지’에 있다
정일관 시 <경례> <검은 가지>
글 최규화 (기자)/ realdemo@hanmail.net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의 말실수 때문에 세상이 한참 시끄러웠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말실수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실수’라는 낱말 속에는 함정이 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잘 숨겨두지 못하고 있는 대로 뱉어버리면 말실수가 된다. ‘생각 단속’에 실패하면 말실수가 되는 것. 결국 ‘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다.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파업.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라는 말에 담긴 이언주 국회의원의 생각은 그냥 ‘불편함’ 정도가 아니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라는 말에는 단단한 몰상식이 들어 있고, “미친놈들이야, 완전히”라는 말에는 뿌리 깊은 편견이 느껴진다.
경례
네모난 강당에서
천장 높은 체육관에서
모두가 일어나 한 곳을 바라보며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할 때,
나는 흘러내릴 듯 처져 있는 청홍 팔괘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간다.
찬연히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대하여 경례.
저 파란 하늘과 둥근 구름을 향하여 경례.
살구나무와 배롱나무에게 충성.
나무 사이를 날아오르는 새들에게 단결.
멀리 아늑하게 흐르는 산줄기와
천천히 감고 돌아가는 강물,
논두렁 밭고랑 닮은 주름과
검은 세월이 내려앉은 얼굴,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들께
경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국가는 국회의원이 갖는 여러 가지 권한을 법으로 보장해뒀다. 이언주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권리가 보장돼 있다면, 학교급식 조리사들에게도 노동자로서 쟁의행위라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입법기관’ 국회의원에게 새삼 법적 권리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 참 서글프다.
이언주 국회의원의 머릿속에 있는 ‘정규직’은, 어떤 계급이나 자격이나 벼슬 같은 것을 말하는 낱말인가 보다. 정규직은 그 무엇도 아니다. 그냥 정규적인 일자리다.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누구라도 와서 일해야 하는 일자리. 10년째, 20년째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밥하는 아줌마”가, 이미 정규적인 일자리의 주인인 “동네 아줌마”가, 그 역할에 맞는 이름을 다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언주 국회의원의 머릿속에는 많이 못 배우고, 월급 조금 받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비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마다 언론과 정치권에 등장하던 ‘급식대란’이라는 말은 이번에도 역시 등장했다. 그 말대로라면 이들은, 하루만 일손을 놓아도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루라도 일에 차질이 생기면 큰일이 벌어지는 중요한 분들. 하지만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의 눈에는 정규직화를 시켜줄 필요도 없는 그냥 “밥하는 아줌마”일 뿐이다. ‘급식대란’과 “밥하는 아줌마”에 담긴 이 극단적 시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일관 시인의 시 ‘경례’. 시집 <너를 놓치다>(푸른사상/ 2017년) 39쪽에서 찾았다. 국회의원들의 공식 행사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빠지지 않는다. 국가가 준 권한과 책임을 잊지 않으며 충성을 다짐하는 의식은 당연히 의미 있다. 하지만 이언주 국회의원처럼, 충성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한다. 태극기에 충성하지 말고, 그 빨갛고 파란 천 조각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국가의 실체는 국민이다. 매일같이 실체 없는 허공에 충성을 맹세하며 진짜 주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그만둬라.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 “논두렁 밭고랑 닮은 주름과/ 검은 세월이 내려앉은 얼굴”에게 충성해야 한다.
검은 가지
만산에 흐드러진 꽃그늘,
연한 신록이 아름다운 것은
검은 땅
검은 숲
검은 나무
때문이리.
흰 매화 천 송이,
흰 벚꽃 만 송이,
검은 가지 아니면
어찌, 만발할 수 있으리.
거친 노동,
얽힌 뿌리,
못난 얼굴 아니면
꽃잎들 어찌,
그토록 못 견디게
흩날릴 수 있으리.
비슷한 시기, 말 때문에 사과해야 했던 또 한 사람.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다. 그가 운전기사에게 한 폭언이 공개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 ×× 대가리 더럽게 나쁘네. 왜 이런 ××들만 뽑은 거야.”라는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욕설이 들어 있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
“너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다. 아비가 뭐 하는 놈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런 것이냐.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라는 말에는 그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막말의 이면에 담긴 확고한 계급인식 말이다. ‘나는 너한테 월급을 주니까 막말을 해도 돼. 너는 나한테 월급을 받으니까 막말을 들어도 참아야 되는 거야.’라는 인식. ‘노동자’와 ‘노예’라는 낱말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 기업의 ‘회장’씩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참담하다.
<너를 놓치다> 68쪽에 실린 시 ‘검은 가지’는 노동의 이면, 행위의 이면, 현상의 이면을 보게 한다. “거친 노동,/ 얽힌 뿌리,/ 못난 얼굴”들은 월급 푼이나 받으면서 막말이나 들으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다. “검은 땅/ 검은 숲/ 검은 나무”의 노동은 때로는 “흐드러진 꽃그늘,/ 연한 신록”으로, 때로는 “흰 매화 천 송이,/ 흰 벚꽃 만 송이”의 빛으로 모습을 바꾸어 존재한다. 검은 노동은 모든 색으로 변화하는 빛의 원천이다. 검은 색은 모든 색을 품고 있다.
‘검은 가지’는 말한다. 내 삶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누군가의 노동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타인의 땀 한 방울이 내 삶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노동 속에서 나를 읽으라고. 이언주 국회의원이나 이장한 회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할 진실이, 검은 가지의 이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