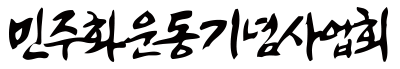이미 죽은 사람들이 겨우 살아 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겨우 살아 있다
김일석 시 <기쁨의 시>
글 최규화 (기자)/ realdemo@hanmail.net

어제 저녁이었다. 퇴근 시간, 막 사무실을 나서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둘째 아이가 다쳤다고 했다. 두 살, 네 살 두 아이를 욕조에 앉혀 목욕을 시키고 있었는데, 어디에 날카로운 것이 있었는지 둘째 아이 손가락이 찢어졌단다. 아이들을 닦이고 입힐 여유도 없었다. 119를 불러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다.
지난달에 돌잔치를 한 둘째 아이는 이제 10킬로그램. 굵기가 나무젓가락만큼은 될까 싶은 왼손 검지 끝마디에 살갗이 동그랗게 파여 일어났다. 피를 흘려 기운이 다한 아이는, 엑스레이를 찍는데도 울지 않았다. 아이를 세워 안고 있으니, 아이는 내 어깨에 고개를 얹고 축 늘어졌다.
다행히 신경에는 이상이 없다 했다. 항생제 주사를 놓자 아이는 울었다. 마취제 주사를 놓자 더 크게 울며 몸부림쳤다. 아내는 아이의 몸을, 나는 아이의 그 작은 손가락을 꽉 잡았다. 아이 손가락보다 더 커 보이는 바늘로 두 바늘을 꿰맸다. 한 바늘쯤 더 꿰매야 하는데 아이가 자지러지는 통에 그만뒀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에게 “괜찮아, 이제 안 아플 거야” 말해주는 것밖에는. 손을 꿰매는 동안에도 피가 뚝뚝 떨어져 응급실 하얀 침상에 붉은 점을 수없이 찍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내 가슴이 움푹, 움푹 파이는 것 같았다. 무력했다. 너무 아팠다.
나는 영유아 전문지 기자다. 하필 그날은 너무 무력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아픈 부모들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취재한 날이었다.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자식의 출생신고도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들 말이다. 아이의 시신을 담은 하얀 상자는 너무 작았다. 아픈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두고 마음껏 안아보지도 못한 부모들.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부모들에게 너무 가혹한 결말이 찾아왔다.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한 달이나 지나야 나온다 했지만, 의료사고 가능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에는 결핵 감염, 올해는 벌레 수액 등 불명예스러운 사건사고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병원.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실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시간은 멈춘다. 다른 가족 누가 아프더라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돈 문제까지 겹치면 무릎이 꺾인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두고 어떻게 흥정을 할 수 있나. 절망에 잡아먹히는 것은 한순간. 문재인 정부가 그런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고 시작한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다. 비급여 항목을 대거 급여화해,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게 요지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게 싫단다. 12월 10일 서울 대한문 앞에 3만 명이 모여 집회도 했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병원이 정하고, 급여 항목의 가격(수가)는 건강보험이 정한다. 비급여 항목이 대거 급여화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 병원의 수익성이 떨어져 줄줄이 망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결국 ‘돈’이다. 결국 ‘이익’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늘로 높아질수록, 환자 가족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라앉는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숭고하다. 그런데 그 숭고한 일을 업(業)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왜 숭고하지 못한가. 왜 스스로 숭고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가. <붉은 폐허>(산지니)는 김일석 시인이 지난 9월 출간한 시집이다. 그는 시집 맨 앞에 실린 ‘시인의 말’을 “30여 년의 투병, 아내가 쓰러진 지 6년, 핍진한 생애, 그 우울의 행간을 위로하는 유일한 휴식이고 투쟁이었던 시.”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사람은 언제 죽는가. 마음을 잃으면 죽는다. 사랑하는 가족을 병원에 눕혀두고 돈 걱정에 가슴만 치고 있는 이들은,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마음을 잃고 먼저 죽는다. 그리고 핏덩이 어린 아이들을 황망히 떠나보낸 부모들의 마음도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닐 것이 분명하다. 이곳저곳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겨우 살아 있다.
시집의 121쪽부터 125쪽까지, 일흔여덟 행에 걸쳐 쓰인 긴 시를 모두 이곳에 옮겨 적는다.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단 하나를 지키겠다는 사람의 마음, “위험 수술 생명 생존율 동의서 사망이란 언어들 중/ 생명 하나만을 가슴에 담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붉게 선언”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그들’이 읽길 바란다.
기쁨의 시
당신이 무너질 때
우리가 나눈 막막한 속삭임과
설렘이 추락하지 못하도록 나는
온몸으로 우주의 압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주삿바늘을 찔러도 꿈쩍하지 않는
당신의 몸이 얼마나 슬펐던지
거드름 피우던 옆 침상 할머니가
아들 자랑 늘어놓을 때도
기억의 궤적을 연상하고 지키느라 내 머릿속은
격렬한 소요(騷擾)가 계속되었습니다
너무 깊이 울었고 절망했기에
더는 우울해하지 않으려 몸부림쳤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진 당신의 몸짓과 언어
순결의 빛을 찾아내는 일은
나의 혁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심각한 상태라는 기저부 뇌출혈과 뇌 대동맥류
심장 콩팥의 내분비계 부조화를 말할 때
위험 수술 생명 생존율 동의서 사망이란 언어들 중
생명 하나만을 가슴에 담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붉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체념의 늪에 빠져
생명의 부름켜가 굳을까 봐 난
미친 듯 주무르며 피가 번지고 있을 그
불가측(不可測) 성역의 상처 입은 뇌세포를
내내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혹여 당신의 영혼을 하느님께서 모르실까 봐
손가락으로 항문을 후빌 때도
목과 아랫배 정수리에 매달린 튜브를 통해
멀건 액체가 들어가고 나올 때도
한 번만 봐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흐드러진 꽃의 추억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주님의 이름으로 고해바쳤습니다
어느 새벽 통나무의 옹이 같았던 당신의 얼굴이
옴질거리다 눈꺼풀이 스르르 열리던 날
거슴츠레한 당신의 눈을 마주 보며
기쁨에 겨워 온종일 어찌할 줄 몰라
나는 활짝 핀 봉선화처럼 굴었습니다
병실을 찾은 몇 사람의 긴 한숨과 눈빛, 그
절망의 파편들을 봉쇄하며 울화를 삭히다가도
느리고 어눌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희미한 미소를 보며 아기처럼 기뻤습니다
한 달 두 달이 가고
일 년이 가고 이 년 삼 년이 지나면서
무너진 기억의 성을 빠짐없이 복구하고
엄마의 자리를 재건하겠다는 재활 투쟁은
지폐 뭉치와 신용카드의 협박으로 전이되어
모래알처럼 살갗에 붙어 사정없이 긁어댈 때도
나는 당신이 무수한 전장을 떠돌다
개선하는 전차가 되어 성으로 돌아오는 꿈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 신경외과 병동 계단에 쪼그려
나 좀 도와달라고 벗에게 전화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내 달팽이관을 직격했던
그 희멀건 무심(無心)의 언어들
그 생채기에 꾸역꾸역 찔리다가
졸업 한 학기 남긴 딸아이를 불러 내리고
미친 듯 일감을 만들며 사방팔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어두운 복도를 서성이다
눈곱만한 폰 자판을 두들기며
생애의 바닥에 쟁여진 회복의 언어들을
끊임없이 쓰고 저장했습니다
이제 터널의 끝을 봅니다
안타까이 날 바라보는 당신의 우울도
뇌병변 장애인의 자책과 염세(厭世)도 이제
저 밝은 곳으로 나가면 굿바이입니다
순정이 빠져나간 자리마다 물신이 할퀴었으나
그럴수록 더 깊고 견고해졌습니다
슬프지 않을 때 슬픔이 멀리 있듯
간절한 소망이 없을 때 기쁨의 빛과 멀어지듯
이제 영혼을 다듬어 고요히
당신을 향해 기쁨의 시를 쓰겠습니다
초록빛 나무와 꽃에 침을 뱉으며
가슴이 터져 포기하고 싶었던 그 밤의 절망도
밝아오는 아침이 눈물이었던 시간도
심연을 깨우는 물방울이었을 배웠으므로
이제 별과 나무의 신비를 만나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예지로
기쁨의 시를 쓰며 남은 길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