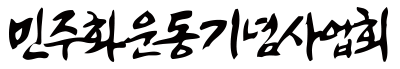태양에 맞서는 콜트콜텍 ‘따개비’들의 연대
태양에 맞서는 콜트콜텍 ‘따개비’들의 연대
11년째 투쟁 중,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김응교 시 <단추> <밀물 기다리는 침묵>
글 최규화 (기자)/ realdemo@hanmail.net

새해의 시작은 1월이다. 대부분에게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4월이 되면 새로운 해를 맞는다. 올해 4월 열두 번째 해를 시작한 사람들. 바로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이다.
2018년 4월 19일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은 서울 등촌동 콜트콜텍 본사 앞에서 ‘잃어버린 11년’을 되찾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 기타를 만드는 콜트와, 콜트악기의 자회사인 콜텍. 2007년 4월 인천에 있던 콜트 공장에서 노동자 56명이 정리해고됐다. 석 달 뒤인 그해 7월에는 대전에 있는 콜텍 공장에서 노동자 67명이 잘려나갔다.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싸운 지, 2018년 4월로 만 11년을 꽉 채웠다.
콜트콜텍은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누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을까. 누가 이렇게 오래 싸우길 원했을까. 최장기 투쟁사업장이라는 말.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날이 4000일을 넘겼다는 말이니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질기게 버티고 싸워왔다는 말이니 명예로운 타이틀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회사는 대화보다 위장폐업과 해외이전을 선택했다.
일하던 공장마저 없어졌다. 그들은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해고노동자의 열두 번째 새해를 맞이했다.
단추
옆 사람이 심하게 졸고 있다
객차가 흔들릴 때마다 내 어깨에 머리를 박는다
검은 넥타이를 보니 상가에서 밤새우고
자부럼 출근하는가 보다
와이셔츠 단추 하나가 떨어지려는데
꿰매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
그나 나나 비슷한 처지라며
작은 단추가 봉지처럼 달랑거린다
가만 어깨 베개 대줬더니
손에 들린 신문처럼 반대편으로 넘어간다
반대편 사람도 저무는 어깨를 대준다
단추도 우리도 악착같이 붙어 있다
김응교 시인의 시집 <부러진 나무에 귀를 대면>(천년의시작, 2018년) 14쪽에 실린 시다. 이 시집을 대표하는 단 한 편의 시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시를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12행의 짧은 시. 어려울 것 하나 없는 일상적인 언어, 일상적인 상황.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란히 앉은 고단한 “어깨”들. “봉지처럼 달랑거”리는 “작은 단추”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 “악착같이 붙어 있다”.
‘해설’을 쓴 정우영 시인은 이 시집을 “한 사람의 뜨거운 긍휼의 연대기이자, 나눔 실천의 목메인 기록”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응교 시인을 “철저하고 투쟁적으로 선두에 서서 앞질러가지는 않으나, 자기 자리에서 느긋하고 단단하게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평했다. 시 ‘단추’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시다. 그리고 지난 11년간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에게 “어깨 베개”를 대준 “작은 단추”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의 곁을 지킨 건 수많은 문화예술인이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홍대 앞 ‘클럽 빵’에서 열리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를 빼놓을 수 없다. ‘기타’로 맺어진 인연.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가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타를 연주하는 인디밴드와 뮤지션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수요문화제를 해온 지도 벌써 10년이 됐다. 그냥 ‘좋은 마음’만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아니다.
홍대 앞 예술인들이 음악을 통해 만들어준 연대의 장.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도 음악으로 소통했다. 그들도 각자 기타, 베이스, 카혼을 익혀 ‘밴드’를 만든 것이다. 악기라고는 잡아본 적도 없던 ‘아재’들이 생고생 끝에 악기를 배우고 밴드를 만들었다. 이름하여 ‘콜밴’. 자신들의 투쟁 이야기를 담아 여러 곡의 자작곡도 만들었다. 수요문화제에서 직접 노래를 불렀고, 다른 투쟁의 현장에서 노래를 통해 연대하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을 가까이서 함께해온 문화연대 활동가 신유아 씨는 “문화적인 시도는 예술가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제작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일상적 문화 행동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자신을 감추고 자신 안의 감수성을 누르는 것이 투쟁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끌어내고, 드러내는 것이 투쟁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 생각한다.”(2018년 4월 9일, 문화연대 홈페이지)라고 썼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은 직접 배우가 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연극 <구일만 햄릿>(2013년)과 <법 앞에서>(2014년)를 무대에 올린 것이다. ‘콜밴’의 카혼 주자인 해고노동자 임재춘 씨는 직접 쓴 ‘농성일기’를 모아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네잎클로바, 2016년)라는 책을 내고 작가가 되기도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남기기 위한 노력은 여러 방향에서 계속됐다. <기타이야기>(2009년), <꿈의 공장>(2010년), <내가 처한 연극>(2013년), <공장>(2013)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2017년 소설가 이상실 작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단편소설 <콜트스트링의 겨울>에 담기도 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2012년 인천에 있던 콜트 공장을 점거했을 때는 여러 미술가가 발 벗고 나서 ‘공장 전시’를 열기도 했다.
밀물 기다리는 침묵
바위에 따닥
따닥 붙어 있는 비릿한
악착스레 운명에 매달린 미생(未生)
소금만 삼키며 허옇게 딱딱한 입술들
태양에 맞서
갯벌 직시하고
밀물이야 더디 와도
파도에 맞아 부서져도
말라붙어 굳도록
아직도 어깨 걸고 연좌하는 따개비들
시집 <부러진 나무에 귀를 대면> 109쪽에 실린 시다. 가장 마지막에 실린 시. 이 시와 ‘해설’ 사이에는 아무 활자도 인쇄돼 있지 않은 페이지가 한 쪽 있다. 그 페이지의 가운데에는 성냥갑만 한 작은 사진이 한 장 실려 있다. 사진 속에 보이는 기타. 한쪽 끝에 ‘콜트’의 로고가 선명하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4월 19일 ‘콜트콜텍 투쟁 11년’ 집회를 앞두고 ‘11일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날들도 역시 “어깨 베개”를 대준 여러 뮤지션과 미술가, 작가와 사진가들이 그들의 곁을 지켰다. “아직도 어깨 걸고 연좌하는 따개비들”. 태양에 맞서는 따개비들의 연대는 여전히 태양보다 더 빛난다.
책장에 꽂혀 있던 책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를 오랜만에 펼쳐봤다. 어떤 기록들이 담겨 있나 드문드문 넘기며 훑어보다가 한 대목에서 눈길이 멈췄다. 마지막으로 그 책 209쪽에서 찾은 문장들을 옮긴다. 임재춘 씨가 농성일기를 쓸 수 있도록 이끈 문화활동가 최문선 씨의 글이다. “작은 단추”와 “따개비들”이 11년간 단단히 지켜온 연대의 역사도, 결국은 ‘잊지 않고 있다’는 작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 아닐까.
농성자들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이 농성 투쟁에 큰 공을 세우거나 많은 일을 한 사람이기보다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켜봐주고, 같이 웃고 떠든 기억의 존재들이니 영화를 찍기 전에도, 구체적인 연대의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미안해하며 주눅 들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농성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존재가 누군가에게서 지워지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 잊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인연은 지속되면 가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