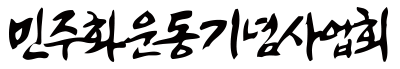대한문의 ‘애국자’들에게 띄우는 시
대한문의 ‘애국자’들에게 띄우는 시
문동만 시 <新창세기 대한문 편> <구르는 잠>
글 최규화 (기자)/ realdemo@hanmail.net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쪽 문 앞에는 큰 화분 두 개가 놓였다. 철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름이 족히 1미터는 돼 보이는 화분 두 개가 인도 위에 널찍이 자리를 잡았다. 대법원에서는 “환경정리 및 미관을 위해서 배치했다”고 밝힌(오마이뉴스 2018. 7. 13. 최지용 기자) 화분들. 대법원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꽃피는 봄날’도 아닌 한여름에 때 아닌 환경미화에 나선 걸까.
그 자리는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이 농성을 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6월에는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농성’ 역시 그 자리에서 진행됐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양승태’와 ‘사법농단’.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했다는 추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법원을 규탄하는 농성들이었다. 대법원이 ‘정리’하고자 했던 ‘환경’은 무엇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그들이 ‘아름다운 경치’[美觀]라 여기는 풍경에는 꽃이나 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 이 모습, 분명히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난다.
신창세기 대한문 편
- 당신의 매혹적인 눈이 남루한 밥그릇에게
밥을 담지 않고 눈을 부라리게 되는 것,
오늘날 불경스러움!의 심화된 논법
사람을 뽑고 꽃을 심으니 보시기에 좋았다
새벽에 힘센 하인들을 보내 초막을 거두고
광야로 그들을 쫓아내니 보시기에 좋았다
불쾌한 것이 불경한 것임을 알게 하라
불편한 것이 불법인 것임을 알게 하라
다시는 저들에게 단 한 평의 공유 지면도 주지 말라
다시는 저들에게 어떤 일도 어떤 밥도
어떤 토막잠도 주지 말라 어떤 언약도 지키지 말라
나무보다 깊은 뿌리를 가진 그들을 뽑고
한때를 살, 꽃을 심으니 보시기에 좋았다
황사 먼지 속으로 쫓겨가는 무리들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다 그들만 좋았다
그리고 그리 말씀하셨다
들이지 말라 다시는, 천국을 지옥처럼 그려내는 자들을
들이지 말라 다시는, 현실을 불의라 선동하는 자들을
잠시간 동산은 고요하였다
비루한 분노와 아우성이 사라져 좋았다
버릇없이 펄럭이는 깃발이 사라져 좋았다
자, 보아라 짐승은 불의를 먹지 않는다
어떤 코뚜레에도 순종하나니, 얼마나 선하냐
저기 어둠을 함께 먹어 없애겠다는 망상의 무리가 있다
그러니 알게 하라
이것이 얼마나 허기진 식량인지
아무리 먹어도 배를 채우지 못하리라
이 동산의 고고함을, 이 체제의 완고함을,
법치에 꽃물을 들여 더 세련되게 목가적으로 은유화하라
사람을 뽑고 꽃을 심으니 보시기에 좋았다
오직 그분만 좋았다
문동만 시인의 시집 <구르는 잠>(반걸음, 2018년) 64~65쪽에 실린 시를 읽으니 내 기시감의 정체가 선명해진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린 때는 2012년 4월이다. 2009년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외침을 처참히 짓밟으며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한 쌍용자동차. 원래 그냥 ‘노동자’였던 노동자들은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뉘었다. ‘함께 살자’며 시작한 공장 점거농성도 무참히 깨져나갔다.
사람들이 정말로 죽어나갔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자도 있었고 그의 가족들도 있었다. 살려고 싸움에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온 벗들을 기리기 위해 노동자들은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렸다. 1년이 지났다. 영정은 스무 개가 넘었다. 그들은 여전히 상복을 벗지 못했다. 대통령만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어 있었다. 분향소를 차린 지 만 열두 달째 되던 2013년 4월, 공권력이 동원됐다. 아니 그것은 공공(公共)의 안녕을 위한 공권력(公權力)이 아니라, 시민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협박하는 공권력(恐權力)이었다.
구청 공무원 50여 명이 새벽을 틈타 분향소를 철거했다. 시민과 예술가들이 만든 솟대와 화분, 분향소의 집기들은 모두 ‘폐기물’이 됐다. 천막 안에서 잠자던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팔다리가 들려 나왔다. 흙과 나무를 싣고 온 트럭이 재빨리 움직였다. 경찰들은 철거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연행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화단이 만들어졌다. “나무보다 깊은 뿌리를 가진 그들을 뽑고/ 한때를 살, 꽃을 심”었다.
2018년 7월 3일. 5년 전에 뽑혀나간 사람들이 대한문 앞으로 돌아왔다. 서른 번째 영정을 가슴에 안고서. 지난 6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김주중 씨. 사측과 복직 합의도 이뤄졌고, 이미 복직한 노동자들도 여럿이다. 하지만 회사는 시침만 남은 시계처럼 더디게 움직였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햇수로 10년째 이어진 ‘해고의 시간’들. 또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시간의 무게가 사인(死因)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을 막아선 것은 화단이 아니라 ‘애국자’들이었다.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를 벌여온 ‘태극기행동국민운동본부’. 그들은 분향소가 설치되는 것을 주먹으로 막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지상정도 없었다. 차마 손이 떨려 옮기기도 두려운 고인을 향한 모욕과 욕설을 날숨처럼 흔히 뱉었다. 무엇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그것은 인간임을 포기한 야만이고, 용서할 수 없는 폭력이다.
그들의 앞에 한 편의 시를 띄우는 것은 자칫 참으로 무력한 짓일지 모른다. 참 어리석고 속편한 짓일지 모른다. 하지만 <구르는 잠>의 맨 앞에 실린 표제시 한 편을 그들의 앞에 또박또박 읽어주고 싶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것이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밥을 먹고, 사람의 온도를 품은, 사람의 ‘자격’이라고. 가장 인간적인 판타지로 가장 비인간적인 현실 앞에, 한 글자 한 글자 회초리 같은 획들을 놓아주고 싶다.
구르는 잠
아이들은 던진다
돌도 공도 아닌 나뭇잎을
욕도 악다구니도 아닌 나뭇잎을
나는 싸움 구경을 하느라 집에 가지도 못하고
건너편 은행나무에 기대어 물끄러미
바스락거리는 잎과 속닥거리는 입 사이에
누워본다
사는 내내 노란 비명만 터지면 좋겠군
맞을수록 웃음만 나오는 싸움이라면
아무도 아프지 않은 나뭇잎 싸움이나 하고 살면
구르는 잠이나 실컷 자고 살았으면
또 노랗게 달뜬 것들 속에서
누렇게 아픈 것들도 찾아본다
부스럭거리는 기침과
등창이 생긴 등허리를
확 뒤집어줄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과 그것이 함께 뒤집어진다
참외배꼽을 가진 아이들이 나도 함께
뒤집어진다
순간 중력도 없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