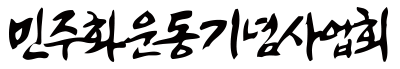‘어린 달팽이’를 걱정하는 대통령을 위하여
‘어린 달팽이’를 걱정하는 대통령을 위하여
- 김용택 시 <쉬는 날> <서쪽> <달팽이>
글 최규화 (인터파크도서 <북DB> 기자)/ realdemo@hanmail.net

쉬는 날
사느라고 애들 쓴다.
오늘은 시도 읽지 말고 모두 그냥 쉬어라.
맑은 가을 하늘가에 서서
시드는 햇볕이나 발로 툭툭 차며 놀아라.
오늘은 그냥 이 한 편의 시만 전해주고 나도 쉬고 싶었다. 이 시를 읽는 순간, 마음이 딱 그랬다.
김용택 시집 <울고 들어온 너에게>(창비/ 2016년) 60쪽에 나오는 시다. 50자 남짓 되는 이 짧은 시는 더 짧은 여러 편의 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시의 절반을 잘라서 “사느라고 애들 쓴다.// 오늘은 시도 읽지 말고 모두 그냥 쉬어라.” 해도 한 편의 시가 될 것 같다. 그것까지 갈 것도 없다면 그냥 “사느라고 애들 쓴다.”라는 1연만 두어도 그대로 한 편의 시다. 시인이 독자한테 “오늘은 시도 읽지 말고” 쉬라고 하는 걸 보니, 얼마나 쉬고 싶은지, 쉬게 하고 싶은지 알 것도 같다.
정말 우리는 너무 애들 쓰며 살았다.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았다’는 것뿐인데, 그 하나 하는 것도 벅차서 참 애쓰며 살았다. ‘살았다’ 앞에 ‘먹고’라는 두 글자가 더 붙으면 그 고단함이 더 잘 느껴진다. 서로가 애들 쓰며 살고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서로가 너무 애들 쓰며 먹고사는 동안 서로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다. 1연이 보여준 무덤덤한 인정. 별다른 찬사도 없고 격 높은 시어도 없지만, 생각도 못한 곳, 생각도 못한 때에 만난 어느 투박한 손바닥이 내 등을 툭툭 쳐주는 것처럼 뜨끈한 위로가 전해진다.
5월 18일에는 한 남자가 보여준 ‘위로’의 장면이 여러 국민들의 등을 두드려줬다. 대통령 문재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개혁적인 인사와, 격식을 무너뜨린 소탈한 행보로 임기 초반부터 국민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중 국민들의 가슴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장면이 바로, 5월 18일 광주 국립5.18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유가족을 안아주던 장면 아닐까 싶다.
‘518둥이’ 김소형씨. 그녀의 생일은 아버지의 제삿날과 같다. 전남 완도에서 직장을 다니던 아버지는 1980년 5월 18일에 태어난 딸을 보려고 광주를 찾아왔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됐다. 김소형씨는 기념식에서 아버지께 쓴 편지를 낭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지켜봤고, 낭독이 끝난 후 퇴장하는 김소형씨를 따라가 그녀를 안아줬다. 김소형씨는 대통령을 안고 눈물을 쏟았다. 그 어떤 개혁적 인사 발표보다, 단호한 정치적 발언보다 무겁고 뜨겁고 단단한 ‘약속’의 장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소형씨에게 ‘아버지 묘소에 같이 참배하자’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두 사람은 김소형씨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했다. 그 모습에 박수를 치고 함께 눈물을 흘린 사람은 비단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서쪽
속이 환한 구름을 보았다.
하루의 서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버려진 새들이 날아가 울 노을이 있다는 것이다.
<울고 들어온 너에게> 73쪽에 실린 짧은 시. 제목부터 따스한 이 시집은 든든한 손길 같고, 단단한 어깨동무 같은 위로의 시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시집이다.
사느라고 애들 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둥켜안고 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울며 불며 아무 말이나 토해도 흉보지 않고, 혹은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다 와도 캐묻지 않는 “노을” 같은 곳이 있다면 말이다. 특히 “버려진 새들”에게 그런 노을의 존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우리 정치는 ‘편’을 가르고 ‘쪽’을 나누는 일에 늘 열심이다. 시도 때도 없이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보는 사람마다 ‘왼쪽’과 ‘오른쪽’을 나눈다. ‘남쪽’과 ‘북쪽’을 나누는 일도 여전히 지겹지도 않은 듯 반복된다. 김용택 시인의 시를 읽고 보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쪽’으로 세상을 나눠야 할 것 같다. 동쪽과 서쪽. 해가 뜨는 동쪽과 해가 지는 서쪽. 맹렬한 발전과 저돌적인 성장으로 달려가는 동쪽과, “버려진 새들”을 위로하고 노을의 아름다움으로 새로운 다음 날을 채색하는 서쪽으로 말이다.
그동안 서쪽으로 날아와 흐느끼는 새들은 내일의 희망찬 아침을 위해 늘 목소리를 죽여야 했다. 이 나라는, 동쪽을 위하는 일이 조국을 위하는 일이라 했다. 서쪽에서 우는 소리가 나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윽박지르거나, ‘배가 불러서 울음도 우는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노을의 붉은색은 북쪽에서 온 것 같다“라며 몽둥이를 들기도 했다. 있어도 없어야 했고, 울어도 웃어야 했다. 서쪽에 선 새들에게는 조국이 없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늘 동쪽만 이야기해왔다. 가끔은 발걸음은 동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눈으로만 서쪽을 보기도 했다. 새로운 대통령은 정말 ”날아가 울 노을“의 가치를 알고 있을까. 5월 18일 이후로, 희망의 눈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이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다.
달팽이
이른 아침 강에 나갈까 해요.
별생각 없어요.
누가 알아요.
그대가 저만치 가고 있을지.
혹시나 해서요.
어디만큼 가면
어린 달팽이들이
자갈 틈에 끼여
고민에 빠져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내가
자갈 하나를
약간 밀쳐줄까 해요.
해 뜨기 한참 전이어서
나는 그들이 늘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던 5월 10일, 서울 광화문의 한 광고탑에서 다섯 명의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왔다. 27일간의 ‘고공단식농성’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정리해고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여섯 명이 올라갔다가 건강 악화로 먼저 내려온 한 사람도 있었다.
4월 14일, 대선 선거전이 한창이던 때 이들은 광화문 광고탑 위로 올라갔다. 보지 않아도 뻔하다. 대선 후보들이 찾아오길 기다렸던 거다. 특별히 ‘누가’ 찾아오길 기다리진 않았을 거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입’만 쫓아다니는 시기. 누구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같은 뻔한 말이라도 한마디 대답해주고, 광고탑 위를 향해 손이라도 흔들어주길 바랐던 거다.
그들은 물과 소금만 먹으며 27일 동안 기다렸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가 찾아왔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통령 후보만이 그들의 굶는 얼굴을 보고 갔다. 대통령 후보가 아니더라도 왔을 사람들이었다. 농성을 해제하고 땅으로 내려온 이들의 허기는 이제 밥만으로 채워지지 못할 것이다.
위의 시는 <울고 들어온 너에게> 82쪽에 실린 시다. 5.18 기념사에서 ‘열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던 대통령처럼, 고공단식농성의 “어린 달팽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 글을 맺을까 한다. 위로의 상징이 된 대통령이 “자갈 틈에 끼여/ 고민에 빠져” 있는 “어린 달팽이”들을 늘 걱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경래 민주노총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 고진수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오수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대표. 장재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